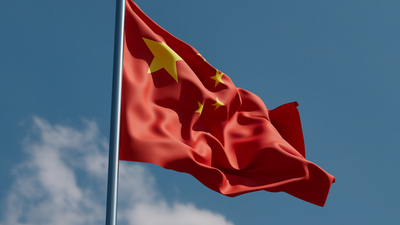금융권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ESG기본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환경(E) 외에도 사회(S)와 거버넌스(G)를 포괄한 ESG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발표에 대응해 정부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공개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ESG금융 지침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는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를 다양화해 ESG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를 통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난 2월 ESG컨프롤타워 역할을 할 '민관 합동 정책회의회'를 설립했다. 금융위원회 또한 같은 시기 'ESG금융추진단'을 구성해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쳐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E(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에서 '녹색금융'과 같은 명확한 지침이 나왔지만, S(사회)나 G(거버넌스) 분야는 아직까지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사회'나 '거버넌스' 분야 공백이 있는 것은 ESG금융에 대한 정의, 목표 등을 명확히 전달할 ESG 컨트롤타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ESG금융을 관리하다보니 표준화가 안 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SG는 장기과제라는 특성 상 5년 단임제에서는 정부차원의 계획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여러 개별법으로 산재한 ESG 관련 법규를 통합한 ESG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ESG 컨트롤타워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ESG기본법은 궁극적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면서 “ESG 공시 의무는 물론 녹색산업 분류체계(택소노미), ESG 채권표준, 그린워싱 방지, ESG 평가기관 감독체계, 글로벌 ESG 규제 대응 등 광범위한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