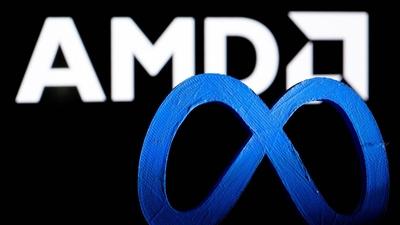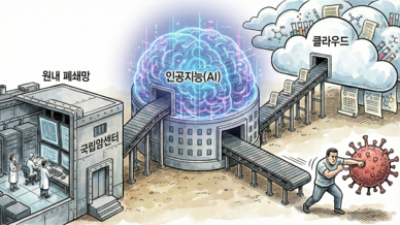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견·중소 정보기술(IT)·SW 업계는 강력 반발한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공공SW산업 대중소 상생의 토대가 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보호·육성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이 각자 강점을 살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규제’로 보지 말아야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규제가 아닌 입법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성공한 제도’라는 것이 이들 생각이다.
제도는 대기업 위주 시장에서 탈피해 중견,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뒀다. 제도 도입 당시 공공SW 시장은 삼성SDS, LG CNS, SK(주) C&C 3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70%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제도 시행 후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20여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공공 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 수도 2만6000여개(2010년)에서 3만2000여개(2018년)로 24.2% 증가했다.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수는 4만8000여명(2012년)에서 6만6000여명(2018년)으로 37.9%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반 중소·중견기업 간 출혈경쟁 등이 발생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분야별 전문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다. 아이티센·쌍용정보통신(교육), 메타넷디지털(재정·세정), 대보정보통신(보건복지), 대신정보통신(통합센터), 세림TSG(클라우드·통합센터), 유플러스아이티(국세), 솔리데오시스템즈(행정정보) 등 주요 기업은 제도 시행 후 10년간 전문 기술력과 인력, 노하우를 확보했다.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소수 대기업에 잠식된 SW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적 지위를 구축한 중견·중소기업이 다수 자리잡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SW 인력 육성·확보에 주력한 결과 수주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수주, 이행 선순환 구조도 만드는 등 공공 SW산업 생태계 전반이 건강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보다 대중소 상생 토대 마련 집중해야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공공SW 산업 품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 됐던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최근 차질이 생기고 개통 시점이 늦춰진 사업 중에는 대기업이 주사업자인 경우도 많다”며 “중견기업, 대기업이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대형 공공 SW 사업은 대기업 부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불안 문제, 추가 과업 발생에 대한 조율 부족, 프리랜서 개발자 관리 문제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했다”며 “이는 대기업이라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이고 품질 문제를 대기업 참여 부재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산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규제혁신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도를 기반으로 각자 영역에서 경쟁력을 쌓으면 건전한 SW 산업 생태계 조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스크톱 PC 제조업의 경우 201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도입 후 중소기업 위주 시장으로 재편됐고 삼성, LG 등 대기업은 공공 대신 기술력이 더 요구되는 고난도 기기 개발과 제조에 집중해 각자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공공 SW 산업 역시 대기업은 하이테크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P, 액센추어,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데 집중하고 중견, 중소기업은 공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대중소가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