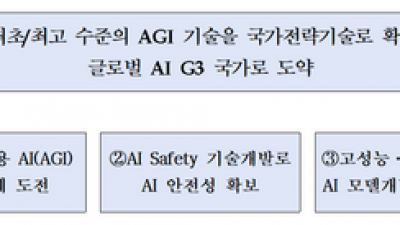몰래카메라 피해자 수십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몇몇 참가자는 과거에 겪은 고통스러운 사연을 소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헤어진 남자 친구가 성행위 영상을 유포했다”며 몸서리치는 여대생도 있었다.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빗발쳤다.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판매·구매자를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벼르는 국회의원도 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과녁이 불분명하다. '몰래카메라가 뭐지'라는 물음표부터 해소되지 않는다. 국회, 정부 관계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법은 물론 카메라 업계도 몰래카메라를 구분 짓는 잣대가 없다. 그나마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카메라로 부르는 게 주류 의견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일치했다. 과거에 발표된 비슷한 법안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초소형 카메라로 정의했다.
적을 골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다. 단순히 크기로 몰래카메라를 판단하면 사람 몸속에도 들어가는 내시경 카메라도 규제 대상이다. 액션캠, 폐쇄회로(CC)TV도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인 드론용 카메라도 경계선에 걸려 있다. 범주를 조금만 넓히면 스마트폰 카메라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내 카메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메라 제조사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 회사다. 초소형 카메라를 수입해 파는 국내 영세 사업자만 옥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보다 성 문화가 앞선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 몰래카메라와 전쟁을 벌였지만 근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초소용 카메라도 비슷하게 설계하도록 조치한 게 전부다.
일본 몰래카메라 시장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소리 나는 사진 대신 동영상으로 선회,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복잡한 퍼즐 뒤에 숨어 있다.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실,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만 난제를 풀 수 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