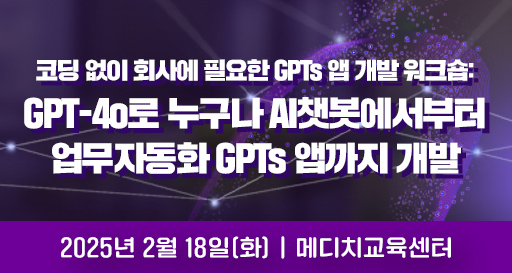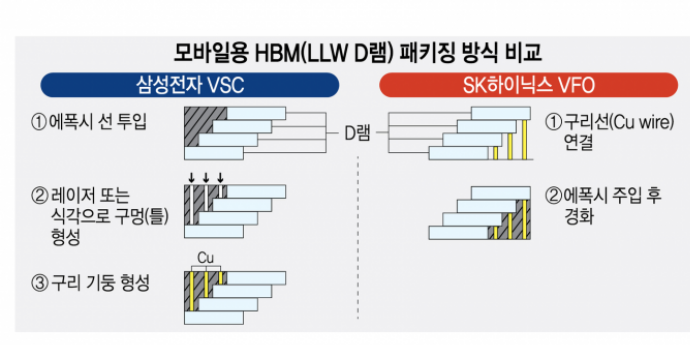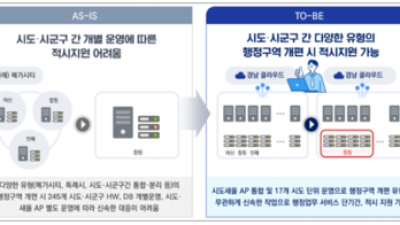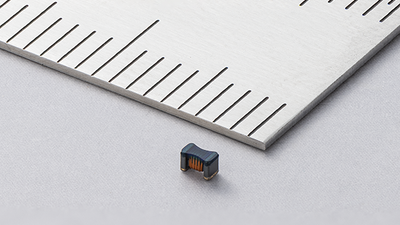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에 직접 나섰다. 과학계의 실험적 연구개발(R&D)이 중심인 제약업계에도 IT가 접목될 지 주목된다.

미국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23앤미(23andMe)는 자사가 보유한 유전자(DNA) 분석 데이터(DB)를 활용해 신약을 만들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유전공학 전문가인 리차드 쉘러를 영입해 치료학 부문을 이끌게 했다. 리차드 쉘러는 세계 최대 생명공학 업체인 스위스 로체(Roche) 계열사 제넨테크(Genentech)에서 15년간 근무했다. 항암제인 아바스틴(Avastin) 및 허셉틴(Herceptin) 발명을 주도했다.
23앤미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아내 앤 워짓스키가 만든 스타트업이다. DNA를 검사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나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 유전적 특징 등 200여 종류에 달하는 정보를 분석한다. 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DNA 검사 키트를 제공해 지난 2013년 기준 이용자가 50만명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현재까지 팔린 키트 개수는 85만개 이상이다.
이처럼 IT 기반 업체가 신약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대다수의 제약 업체들은 과학계의 발견에 기반해 신약을 만든다. 어떤 발견이 나타난 뒤 신약을 제작하고,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 등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23앤미는 자사가 쌓은 유전학 DB에서 유전 물질들의 패턴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신약을 만들 계획이다. 실험 항목들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목표 약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조직 상당 부분은 외주 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앤 워짓스키 23앤미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약업체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을 직접 끌어들일 수 있다”며 “우리의 사업 모델은 신약 개발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앤디 페이지 23앤미 사장은 “우리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약업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전적 문제가 질병의 원인인 경우 신약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이 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해왔다는 점에서 항암제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암 환자들은 면역제 등에 해마다 10만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생명과학 컨설팅·투자 업체 바이오브리트(BioBrit LLC)의 창업자 댄 브래드버리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까진 몇 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승산은 있다”라며 “제약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확실히 업계에서 신뢰성은 쌓인 상태”라고 말했다.
23앤미는 DNA 분석 키트로 유전학 DB를 구축하고 화이자와 제넨테크 등 제약 업체에 이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사업도 해왔다. 제넨테크와도 지난 12월 파킨슨 질병의 신약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로체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다. 앤디 페이지 사장은 “기존 업체와의 협업과는 무관하다”며 “이들이 보유한 관련 제약 성분들을 라이선스해 신약을 만드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임상 실험에 관한 파트너십은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구글·NEA 등으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총 1억26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댄 브래드버리 바이오브리트 대표는 “순수 신약 개발이 목표라면 연간 몇천만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