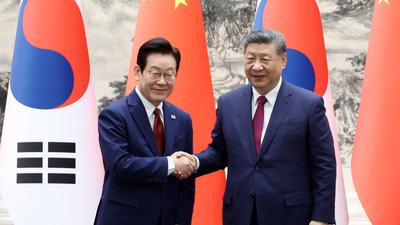참 역설적이다. 비싼 통신료를 잡겠다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한국 휴대폰업체만 잡았으니 말이다. 이른바 ‘단통법의 역설’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국내 점유율은 60%대에서 40%대로 추락했다. 반면에 애플은 15%에서 33%로 갑절이나 늘어났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단통법은 한마디로 ‘보조금 탕평책’이다. 어리숙한 ‘호갱(호구+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을 공개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했다. 결국 특정 스마트폰에 암암리에 투입되던 ‘보조금 폭탄’ 마케팅이 힘들어졌다. 그런데 보조금이 비슷해지자 아이폰 판매량은 늘고 갤럭시는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간 한국 스마드폰의 질주가 보조금의 힘 때문이었다는 ‘역(逆) 해석’이 가능하다. 진짜 그렇다면 ‘단통법의 역설’은 보조금으로 화장한 한국 휴대폰 기업의 민낯을 오롯이 보여준 셈이다. 이른바 ‘단통법 역설의 역설’이다.
공평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자 소비자의 선택이 바뀐 것은 의미심장하다. 가격이 비슷해지자 또 다른 1%의 차이가 소비자의 선택을 갈랐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품질인지, 디자인이지, 브랜드 파워인지 자못 궁금하다.
우울한 소식은 해외에서도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로 추락했다. 철옹성 같던 인도시장에서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 해외에는 단통법 같은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오로지 실력에서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믿었던 국내에서 무너진 뒤라 해외에서 고전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진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여년 전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1% 차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올림픽 100m 경기에서 우승과 2등은 불과 0.01초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 0.01초의 차이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한 사람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만든다.” 이 회장의 이 말은 마이클 조던과 조 클라인의 비교로 종종 회자됐다. 1990년대 후반 마이클 조던이 농구황제로 군림할 당시, 그는 한 해 무려 800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에 그의 동료 조 클라인의 수입은 27만달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조던과 클라인의 실력차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슈팅과 점프슛, 자유투 적중률에서 조던이 1% 앞선다고 지적했다. 사소한 차이가 300배가 넘는 수입을 갈랐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젠 기술적으로 성숙기다.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중국과 인도에선 현지의 값싼 브랜드가 삼성전자를 눌렀다. 성능보다 가격에서 1%의 차이가 벌어졌다. 값싼 가격을 뛰어넘는 특별한 뭔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부활하는 애플은 ‘아이폰6’에서 그 1%의 해답을 어렴풋이 찾은 것 같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갤럭시S6’를 발표한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 제로’로 코드명을 붙였다. 삼성이 애플처럼 과연 새로운 1%의 차이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삼성이 그 해법을 찾는다면 ‘단통법의 역설’도, ‘단통법 역설의 역설’도 한낱 말장난에 그칠 것이다.
장지영 정보통신방송부장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