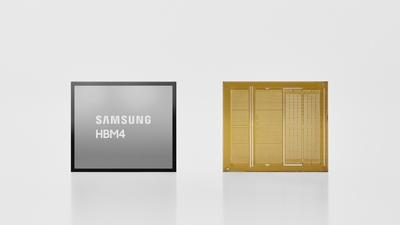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신규상장 기업 수(단위: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신규상장 기업 수(단위:개) 기업공개(IPO)시장이 여러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2014년 증시 개장 후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각각 1개,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부진이라던 지난해 실적(유가증권 4개, 코스닥 37개 상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 신규상장 기업은 2010년 22개에서 2011년 18개, 2012년 7개, 지난해 4개로 계속 감소해 왔다. 코스닥에 새로 이름을 올린 기업도 2010년 74개, 2011년 57개, 2012년 21개로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37개의 신규상장 기업을 냈을 뿐이다.
IPO시장은 기업들이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창구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업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와 꾸준히 성장할 때만이 국내 경제 전반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초기 투자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회수기회를 제공해야만 벤처투자자금도 원활하게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의 상장 질적심사 항목 간소화, 유가증권 상장 심사기간 단축안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도 연초 별도의 상장유치 조직을 신설해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IPO시장에서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 기업공개 담당자는 “기업들이 상장을 꺼리는 것은 상장해도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박스권에 갖힌 증시 회복이 나타나야 IPO시장도 본격적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 시 얻는 이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한 811개 기업 가운데 실제 4개사(0.5%)만 상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을 하면 기업인지도 개선, 유상증자,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의무도 늘어난다. 엄격한 공시의무를 지게 되고 상법상 규정된 각종 상장사 특례규정으로 상장 전과 비교해 많은 규제를 받는다.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도 제한받기 쉽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넘긴 전자업체 한 CEO는 “상장으로 얻는 혜택보다 기업 활동이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별다른 자금조달 욕구가 없고 사업도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아직은 상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20∼30여개 기업이 상장심사를 청구했거나 상장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는 삼성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삼성SDS도 있고 전기밥솥으로 탄탄한 실적을 쌓아온 쿠쿠전자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목받는 우량 기업체 상장은 다른 기업군에도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IPO 활성화 대책, 상장유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올해 IPO시장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신규상장 기업 수(단위: 개) / 자료: 한국거래소 *2014년은 5월 20일 기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