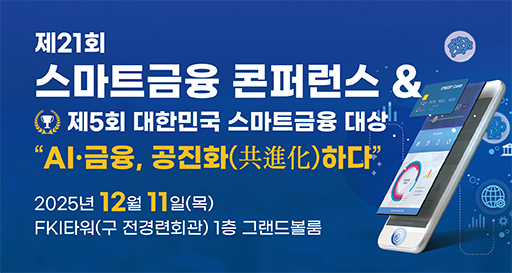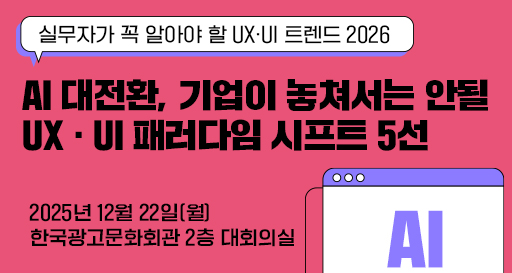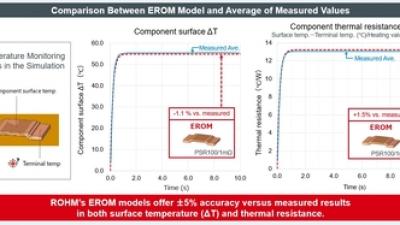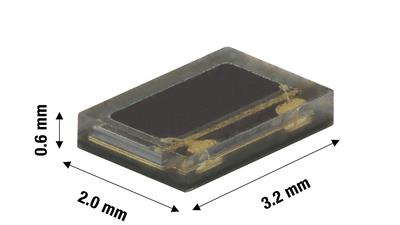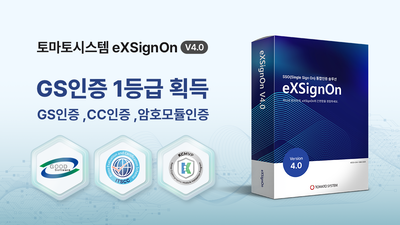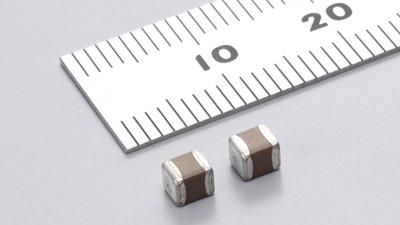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지인들과 지난달 신년회를 겸한 저녁자리가 있었다. 몇순배가 돈 뒤, 화제는 자연스레 역대 수장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이들 국·과장이 꼽은 최고의 장관은 최경환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의외였다. 고시 선배나 석학·교수 출신 정도를 생각했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치인 출신답게 외풍은 막아주면서, 부하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 전 장관은 MB정권 시절 친박계지만 당시 청와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부처 장관의 정책 수행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청와대의 인사원칙은 의외로 간명하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느냐’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전자는 출범 초기에, 후자는 정권 중후반기에 각각 가동된다. 이 원칙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건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작년 이 맘 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인선 원칙은 의외로 ‘전문성’이었다. 그 결과 정치인보다는 연구원 출신 등 전문가 집단의 각료 입성이 유례없이 많았다. 부총리급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최근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해당 분야 연구직 전문가다.
대한민국 관직제상 장관은 ‘정무직’으로 분류된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 데려와 쓰라는 의미도 된다. 이 때문에 정무직에게만 부여하는 게 예산권과 인사권이다. 단적으로 말해 오늘까지 복지부 장관하던 사람, 내일 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혀 놔도 별무리가 없어야 잘 한 인사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까. 박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경질 다음날, 바로 현역 국회의원을 후임에 앉혔다. 집권 2년차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각 얘기가 또 나온다. 장관은 정무직으로 보고 인사해야 할까, 아니면 전문직으로 보고 인사해야 할까.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이제는 그만큼 학습효과를 거둘 때도 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