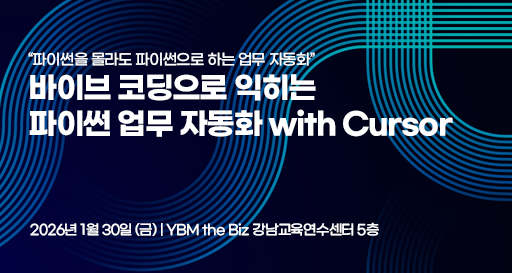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S사 착시로 경고음 못 듣는 한국경제`라는 기사와 보도가 줄을 이었다. S사와 H사의 선전이 마치 우리 산업계 전반이 호황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기 두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은 이익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한다. 또 S사의 제조업 경쟁력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융합산업 대비 제조업의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한 S사가 영업 이익은 A사에 뒤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글로벌 서비스 기업처럼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직계열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와 같은 연합적인 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산업 환경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또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이를 수행할 인재를 확보하는 것과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교육 현실은 미래보다는 일류대학이라는 눈앞의 목표에 급급해 주입식 위주 19세기 학습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엄마표 교육이 엄마표 엘리트를 만들고, 21세기 인재상인 창의력과 자기주도력 있는 인재로 육성할 기회를 박탈한다. 엘빈 토플러는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현행 대중교육을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 안되고 완전히 새로운, 개인화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교육 혁신의 목표는 21세기 글로벌 인성교육과 함께 재능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될 것이다. 지난 달 21일 디지털교과서협회 창립세미나에서 발표한 해외 혁신 사례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싱가포르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디지털교육 접목을 활용한 혁신사례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되었다.
필자는 디지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를, 재능별·수준별 맞춤형 학습 기능, 소셜미디어(SNS)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협업 역량, 그리고 21세기 지식 습득 수단이 될 `디지털 해독(Digital Literacy)`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를 교육공학적으로 잘 활용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IT기업에서 5년을 교육 사업을 담당하면서 희망과 좌절을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러닝 도입으로 PC를 통해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IT기업에 다니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한다는 u러닝, 그리고 농산어촌에서도 실감형 학습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학교 IPTV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실패하는 좌절을 경험했다. 새로운 매체 도입과 함께 그 매체로 교수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론, 매체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그리고 준비된 교사들이 부족했다. 여기에 수단이 되어야 할 기술이 목적이 되어버린 듯, 신기술 도입에 치중했던 결과로 얻어진 당연한 결론이었다.
오랜 시간 교육혁신 경험을 담아 체계적으로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던 스마트교육은 새로운 모습으로 교육혁신의 모델로 전개되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 육성이란 목표에 맞춰야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ICT 접목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 정책들이 추구했던 교육적 목표까지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더라)의 오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옥태 디지털교과서협회 사무국장 imo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