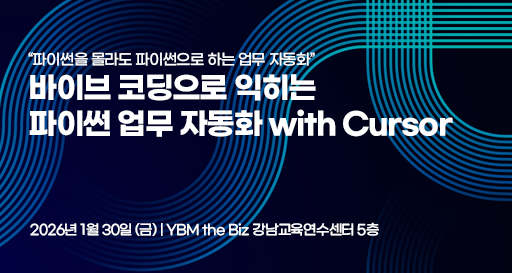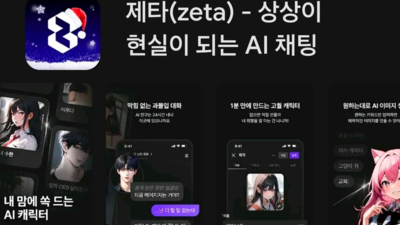1896년 영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세관 관리들이 남루한 행색의 이탈리아 청년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물건, 폭탄 아닙니까?” 결국, 영국 관리들은 그가 갖고 있던 이상하게 생긴 전기장치를 부숴버렸다. 당시 22세이던 이탈리아 청년의 이름은 `굴리엘모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영국 관리들이 부숴버린 이상한 물건은 마르코니가 개발한 무선전신기였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연구 지원을 거절당하자 영국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입국하던 참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01년 12월 12일. 마르코니는 영국 폴두에서 뉴펀들랜드까지 무려 3380㎞ 거리에서 대륙 간 무선통신에 성공한다. 첫 번째 송신문자는 모르스 부호 `S` 자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무선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 통신회사를 설립하고 영국과 교신하기 시작했다. 과학자이자 기업가인 마르코니의 열정적인 도전 덕분에 오늘날 스마폰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
마르코니 뿐 만이 아니다. 엔지니어 출신 기업가들이 세상을 바꾼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도 자신의 발명품을 인류 미래에 기여할 창조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1878년 그는 회사를 창업했다. 이후 급성장해 세계 최고 전신회사인 웨스턴유니언까지 인수했다. 그레이엄 벨이 일궈낸 성공은 전화 기술을 발명한 행운도 있지만 `미래를 보는 눈`과 `창조적 정신`을 가졌기에 가능했다.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꼽았다. 창조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기업가야 말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1937년 마르코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방송사들은 이례적으로 2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전파의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추모였던 것이다.
기업가 역할에 주목한 슘페터의 주장은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정보기술(IT) 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빛을 발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지금처럼 창조·혁신·진취의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시기는 없었다. 창조적 도전이 강조되면서 성공한 기업가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대상으로 떠올랐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로 매도하던 과거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에게 기업 호감도를 물어봤다. 결과는 100점 만점에 49.8점. `기업호감지수(CFI:Corporate Favorite Index)`는 국민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수치다. 호감지수 49.8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하반기(48.1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업 호감도가 계속 떨어져 `비호감`이 더 많아진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봐도 기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대기업 경영자는 문어발식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고,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망한다`고 기술됐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나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와 같은 기업인을 소개한 교과서는 단 한 권에 불과하다. 그나마 간략한 사진 설명에 그친다. 기업가의 이윤 창출 성과를 인정하지만, 사회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렸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기업가 출신 장·차관급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직을 포기했다. 하지만 모두가 혁신을 말하는 지금이야 말로,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창조적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 기업가들이 존경받으며 사회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주상돈 벤처경제총괄 부국장 sd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