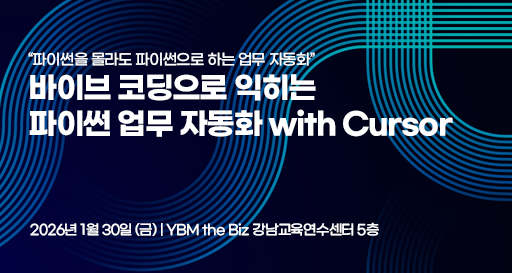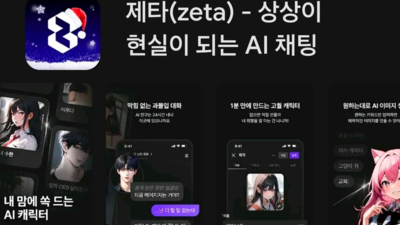정보통신기술(ICT)이 지난해 벤처 투자처 1순위에 올랐다. 200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ICT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스마트 혁명으로 다시 ICT가 유망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사실 지난해 히트 상품은 대부분 ICT에서 나왔다. 애니팡, 드래곤플라이, 김기사 등 모바일 앱이 첫손으로 꼽혔다. `강남스타일`로 대변되는 문화상품의 글로벌화도 두드러졌다. 밴처캐피털이 당연히 ICT와 콘텐츠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마련됐다. ICT에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미국 벤처캐피털업계는 지난해 소프트웨어에 무려 75억달러의 뭉치돈을 투자했다. 투자 회수 측면에서 ICT만큼 매력적인 곳도 없기 때문이다.
투자로 돈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인재도 몰린다. 돈과 인재는 제2의 벤처신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한국은 이미 2000년 초반 `벤처 붐`을 경험했다. 닷컴 버블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벤처 투자 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IMF 구제 금융 위기 조기 졸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넥슨 등 유망 기업의 탄생이라는 성과도 일궈냈다.
박근혜 새정부도 경제회생 전략으로 ICT와 과학기술 분야 투자확대를 첫손으로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면서 제2의 벤처 붐을 예고했다. `창업경제`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ICT와 과기분야에 적지 않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세계 경제 흐름과 우리나라의 ICT·과기 역량을 감안하면 아주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문제는 얼마나 유효한 정책을 실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과거 벤처 활성화 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점을 계승하되 단점은 혁파해야 한다. 무조건 정부 예산을 쏟아붇는 식의 원시적인 정책도 안 된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 벤처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창업의 어려움으로 `연대 보증제`와 같은 족쇄를 꼽는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지속 성장 가능한 제도와 규제를 이 참에 확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혁신을 생각해볼 때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에이전틱 AI 시대의 서막, 에이전트노믹스의 등장
-
2
[인사] 경찰청
-
3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디지털 자산시장 2025년 회고와 전망
-
4
[ET톡] 게임산업 좀먹는 '핵·매크로'
-
5
에스에프에이, 신임 대표에 김상경 전무 선임…SFA반도체 수장도 교체
-
6
[콘텐츠칼럼]한국 영화 위기 '홀드백' 법제화보다 먼저 고려할 것들
-
7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10〉AI시대의 소통과 대화법 (상)
-
8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79〉 [AC협회장 주간록89] 세컨더리 활성화, 이제는 'AC·VC 협업' 시간이다
-
9
[부음] 이상벽(방송인)씨 모친상
-
10
[부음] 전순달(고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 부인)씨 별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