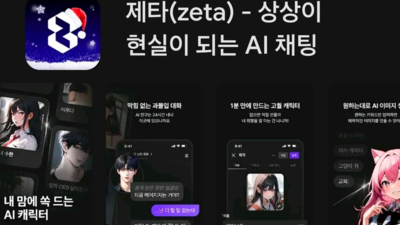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경고`와 `친서`는 낱말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졌다. `경고`는 말 그대로 잘못했음을 꾸짖으면서, 잘못이 되풀이되면 벌을 주겠다는 예고 또는 통고다. `친서`는 높은 분이 몸소 쓴 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높이거나 축하할 때 보낸다.
이렇게 이질적인 단어가 조합된 `경고친서(警告親書)`가 지난 한 시대를 풍미했다. 1970년대 후반 신문 정치면을 들춰보면 심심찮게 등장했던 단어다.
당시 청와대를 지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실세 측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가끔씩 보냈다던 무시무시한 `경고친서`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사회 분위기 자체가 서슬퍼렀던 시절이다. 느닷없이 경고친서를 받아든 인사는 오금이 저려 제자리에 주저앉거나, 멀쩡한데도 휘청이곤 했단다. 그래서 경고친서는 공포정치의 한 상징이기도 했다.
장막 뒤에 숨은 최고권력자는 자기 표정도, 의중도 드러내지 않은 채 정적이나 반대자에게 총구 같은 `친서`를 겨눈다. 어디서, 누구에게로 날라올지 전혀 모른다. 공포는 `뭔가, 누군지` 모를 때가 가장 심한 법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개편 내용을 내놓고, 숨가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국민들언 어떻게 돌아가는 형국인지 깜깜하기만 하다. 최대석 외교통일국방분과 인수위원이 지명 엿새만에 짐을 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직도 속시원한 답이 없다. 그래서 최 위원이 그때 받았다는 쪽지가 혹 `경고친서`는 아니었을지 설만 무성하다.
`입도, 귀도, 눈도 없다(No mouth, no ears, no eyes)`는 인수위 행보에 시집살이를 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뤄졌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반대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반대론자 또는 동조 거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는 설명과 이해다. 인수위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대통령이 `그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총리, 부총리 지명, 국무위원 인선, 그리고 공약 변경과 같이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결정거리가 여럿 남았다.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빚을 수도 있다.
당선인을 포함해 국민 앞에 나서 왜 이사람이 필요하고, 왜 처리가 필요한지 소상히 설명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박 당선인에게 더욱 절실하다. 대통령 아버지를 벗어던져야 100% 국민 속에 설 수 있다. 그때야 반대자를 제거해도 큰 반발없이 굴러가는 시대였다. 지금은 반대자까지 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 선거 유세 때 철썩같이 약속했던 `열어두겠다`던 그 마음을 벌써 `닫아버린`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