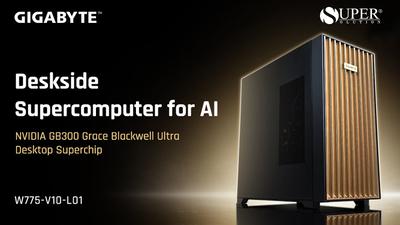정보기술(IT)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다.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에 보내는 제안요청서(RFP)다. 여러 조건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 맞춰 기업은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제안서를 만든다. 발주 기관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
만일 이 RFP를 발주기관이 아닌 업체가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자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이런 일이 공공 IT사업에는 비일비재했다.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도 뒷말이 무성했던 이유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런 관행을 수술한다. RFP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발주하는 공공 IT사업에 의무화했다.
진작 나왔어야 했다.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해야 할 RFP를 수주 예상 기업이나 기존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아예 작성까지 맡기는 일도 있다. 발주기관이 전문성이 떨어져 민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해 당사자에 자문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입찰 비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새 제도로 발주기관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불편함도 투명한 입찰과 최적 사업자 선정이란 대의에서 양보해야 할 사항이다. 발주 기관은 이참에 전문가를 영입하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술력이 있어도 수주 경험이 없어 경쟁에 밀린 중소 IT기업에겐 새로운 기회다.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오로지 실력으로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새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산다. 발주 기관이 불편하다며 다시 옛 관행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도 막는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핵융합의 산업적 가치〈1〉왜 핵융합이 주목 받는가
-
2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23〉실리콘 밸리와 판교 분당의 만남
-
3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82〉 [AC협회장 주간록92] RWA 규제 파고...AC·VC LP 전략 다시 설계할 때
-
4
[ET단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가계 부담' 상승…캐피털슈랑스로 해결하자
-
5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46〉사람을 배려하는 에이전틱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상)
-
6
[인사] 교육부
-
7
[부음] 김국주(하이뉴스 대표이사)씨 부친상
-
8
[부음]류태웅(전자신문 기자)씨 빙조모상
-
9
[부음] 안성수(서울경제신문 마케팅1부장)씨 부친상
-
10
[관망경] 에너지의 무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