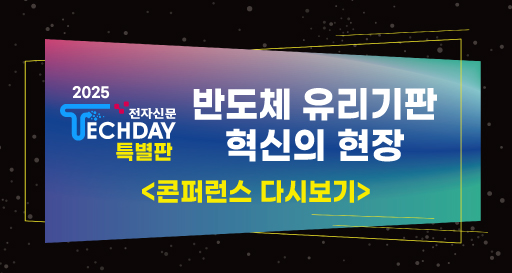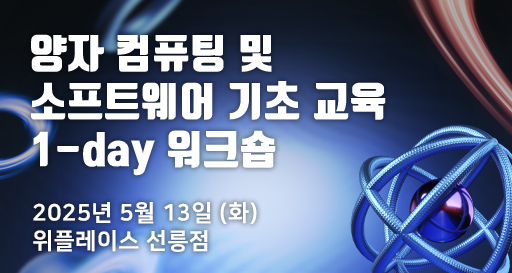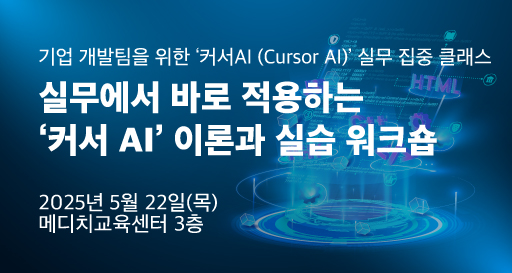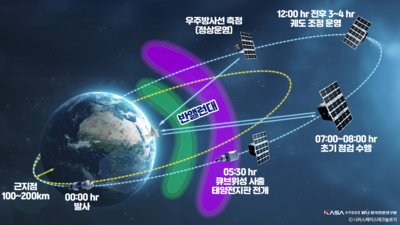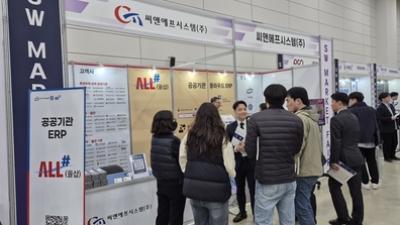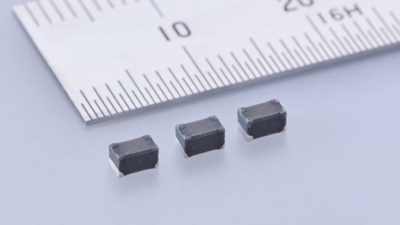‘1121’. 프로야구 팬이라면 익숙한 숫자다. 한국시리즈 세 번 우승과 한 번 준우승. 김성근 전 SK와이번스 감독이 2007년 부임한 이래 거둔 성과다.
그의 좌우명은 일구이무(一球二無)다. ‘공 하나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위기마다 물러서지 않았다. 실패도 있었다. 끝내 실력으로 이겼다. 독한 야구다. 집념과 철저함이 팀을 명문구단으로 만들었다. 와이번스는 타 구단에는 ‘공공의 적’이었다.
이랬던 팀이 빈틈을 보인다. 그가 재계약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빚으며 전격적으로 해임된 이후부터다. 관중의 환호성도 작아졌다. 조직(와이번스)에 맞는 가치(승리)와 혁신 전략(데이터 야구)을 세우고 팀을 장악했던 리더가 갑자기 사라진 탓이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있다. 경영학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쓴다. 도널드 N 설 하버드대 교수가 ‘기업혁신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제시했다.
내부 핵심 인사인 ‘인사이더 CEO’는 조직 생리를 잘 알고 있지만 과거 방식에 집착한다. 설 교수는 우량기업이 쇠퇴하는 것을 성공의 덫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껏 잘해왔는데”와 같은 확신에 찬 공식을 경계한다. 외부에서 영입한 ‘아웃사이더 CEO’는 참신하지만 기업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들도 전 직장의 방식을 따라한다. 섣부른 개혁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는 내부 구성원으로 핵심 사업이 아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기업 사정에 밝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우리 사람’이라는 직원의 믿음 속에 혁신을 이끈다.
이런 인재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여러 후보를 뽑아 다양한 업무를 맡기라고 충고한다. 시야를 넓히고 실전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인재의 특성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자연스레 후계자가 생긴다.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룬 것을 지키기 어렵다(創業易守成難). 아는 말이지만 역시 실천은 힘들다. 와이번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며 궁금해진다. 우리 기업은 어떤 CEO 승계 계획이 있는가.
김인기 편집2팀장 i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