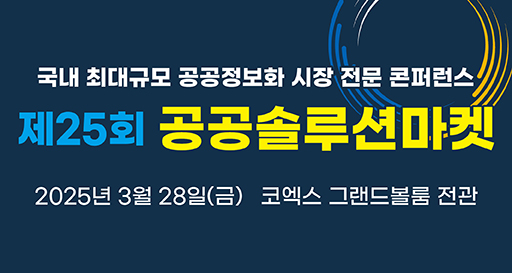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방송·통신’과 ‘방송통신.’
점(·)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두 표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방송·통신’은 서로 다른 분야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표출되지만, ‘방송통신’은 그야말로 두 개의 분야가 하나로 화학적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 분야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의 1위 IPTV사업자이자 1위 통신사업자인 PCCW를 방문했을 때다. PCCW 고위관계자로부터 회사의 통신사업과 방송사업 현황을 들은 뒤 ‘당신네 회사는 그러면 통신사업자로 불리기를 원하냐, 아니면 방송사업자로 불리기를 원하냐’고 물었다. 답변은 어느 한쪽이 아닌 ‘통신방송사업자’로 불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통신과 방송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통신과 방송사업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이라면, 자신들의 회사 앞에 붙는 수식어가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로 나뉘어 설명되기보다는 ‘통신방송사업자 ○○’로 정착되는 것이 사업추진에도 더 깔끔하다.
지난 2008년 11월 최초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IPTV는 바로 이 ‘방송통신(융합)’의 대표 아이콘이다. IPTV서비스는 방송과 통신계의 서로 다른 규제 철학과, 상충하는 이해 관계 대립으로 인한 논쟁을 뒤로 하며 어렵게 출발했다. 이후에도 포화된 유료방송시장, 유무선 통신 합병에 따른 IPTV서비스의 기업 내 존재가치 감소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IPTV는 연간 약 3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면서, 현 정권이 추진한 정부허가사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시장정착기에 연착륙해 있다. 실제로 사업초기 가입자 100만 돌파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후 뉴미디어업계에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매직숫자로 통하는 200만 가입자 확보까지는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어떤 매체보다 단기간에 서비스 활성화의 분수령을 넘은 것이다. IPTV는 올해 300만을 넘었고, 내년에는 500만을 넘을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이 같은 성과에는 방통위·협회·IPTV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의 공동 노력과, 교육·국방 등 공공분야의 수요 창출을 통한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디지털케이블TV·스마트폰 등 타 매체와의 연계 시범사업 추진 등이 돌파구가 됐다. 소외계층을 겨냥한 IPTV공부방, IPTV효도방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을 파고 든 것도 주효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및 수행단에 갤럭시 탭 단말을 제공하고 와이브로 기반의 무선 IPTV 서비스를 제공해 방송통신 강국의 이미지를 높였다.
IPTV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당시, 통방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던 유일한 사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폰에 이은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TV와 가장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격동기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의도했건 안 했건, IPTV는 n스크린 등 스마트TV에 가장 근접한 매체로 부각되면서, 스마트TV로의 전환에 징검다리 역할로도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역할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생태계와 질적향상을 고려한 자기 혁신이 IPTV업계에 요구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