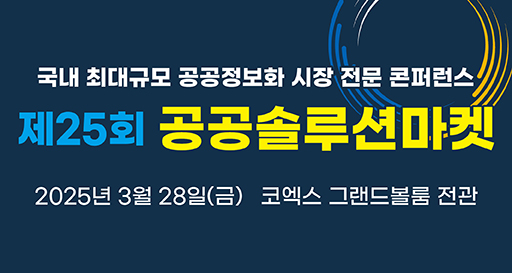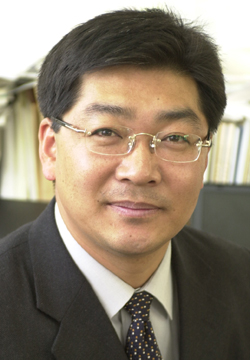
4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의 과학과 문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덕특구 2단계 개발계획은 진척이 없다. 특구 지원 예산은 줄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최근엔 기획재정부와 연구회 등이 전 출연연구기관의 임금 현황을 잇달아 요구하면서 기관통합이 시작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고문)을 중심으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를 꾸려 향후 출연연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다.
10년전만해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현 대덕특구본부)가 운영하던 대덕과학문화센터는 가끔 이름있는 연주회와 공연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줬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의 상징이던 이 센터는 현재 모 대학에 팔려나간뒤 활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특구 한 가운데 있는 체육공원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치과학자의 체력 단련을 위해 만든 9홀짜리 골프장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계좌를 나눠주고 주말엔 과학기술인들에게 우선 이용에 관한 혜택을 주는 등 평일 밤새가며 연구하던 과학기술인들이 오순도순 모여 운동도 하고 정겹게 마음을 나누던 곳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가 최근 이용 계좌 모두를 연구기관으로부터 회수했다. 명분은 기업인들에게 재분배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열 받을 만하다. 이 골프장 바로 옆 5분 거리엔 대전시가 기업인을 위해 조성한 골프장이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할 판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떨까. 과학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연구비과세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더이상 없다. 과학자 자녀의 연구단지내 학교배정 우선권도 은근슬쩍 사라졌다. 연구원들은 3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쓰다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떠날 궁리만 한다. KAIST의 테뉴어 제도같은 영년직 시스템은 유명무실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소통로도 부실하다. 과거엔 연구현장을 거친 사람들이 기관장도 맡고, 장관직도 맡았다. 경상현, 양승택 전 장관 등이 모두 ETRI 원장을 거친 경우다. 이승구 차관은 국립중앙과학관장직을 수행하다 차관으로 발령받아 서울로 올라갔다. 안병엽 장관은 퇴임후 KAIST와 통합전의 ICU(정보통신대학교) 총장으로 내려와 대학 학부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 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처간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엔 현장 연구원 출신이 안보인다. 비서관은 물론, 행정관 자리에도 연구원 출신은 없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보금자리는 김밥집 2층 전세방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ICT(정보통신)기술도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고, 외면이니 하는 이야기는 더이상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은 12년을 훈련한 결과이지만 오서 코치와 같은 지도자와 스텝의 도움, 무엇보다 지속적인 투자가 없이 불가능했다. 대덕엔 그나마 있던 투자와 관심마저 사라지고 있다.
박희범 전국취재팀장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