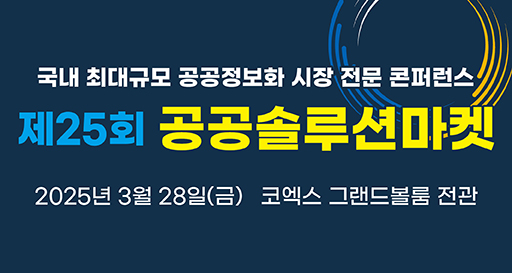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데 회사 출입구의 전자시스템에 ID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 회사 동료의 ID카드에 묻어 사무실에 들어갔다. 총무과에 물어보니, ID카드 고장이 아니란다. 시스템 또한 고장이 아니다.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 다음날도 상황은 역시 같았다. 매일 동료의 ID카드에 묻어 다녀야 할 판이다.
#임원 회의실. 회의실에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 오는 순서대로 앉는다. 그런데 명패가 있다. 그것도 급조한 듯, A4 용지를 접어 옹색하기 그지없다. 회의실에는 당연히 등받이가 높은 회전의자가 있게 마련이다. 같은 높이로 잘 정열된 의자 사이로 이 빠진듯 한 자리가 비었다. 그곳에는 급조한 명패와 낚시터에 쓰는 접이식 간이의자가 있다. 회의 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탁자 위로 얼굴만 나올 것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의심하겠지만 위의 예시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신호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암시다. 그것도 일반적인 명퇴와 다르다. 회사의 설명도 없고 주위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이 정도면 중죄다. 파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다. 빤히 보이는 굴욕과 수치를 안겨줄 정도라면 엄청난 해사행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 경우가 맞을 것이다. ‘인내의 종점’인 자존심을 건드려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심리적 능지처참’이다.
섬뜩한 사람 자르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오죽했으면 기업이 그런 방법까지 동원했겠냐는 데 오히려 동의표를 구한다. 조직의 화합과 주위의 눈을 살펴야 하는 기업에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같은 형벌을 실행할 곳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합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정서법을 위반해 ‘먹통 ID카드’를 목에 걸고 회의실 ‘낚시의자’에 앉을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연차수당 자연사랑’의 주인공들이다. 박연차에게서 ‘수당’받고 故 장자연에게서 ‘사랑’받은 이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한쪽은 탐욕과잉의 시대에 도덕성을 ‘정권의 상징’인 양 앞세워 5년간 지배계급을 이뤄오던 부류다. 그들의 죄는 국민의 코 묻은 돼지저금통을 모아 선거자금으로 썼던 가식이다. 권력의 거래(?)를 통한 축재를 비루한 천민의식이라고 칼날처럼 지적했던 의기양양한 거짓말이다. 또 다른 쪽은 청소년의 우상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검은 딜’을 일삼은 무리다. 더욱 용서가 안 되는 점은 힘 없고 약한 상대를 뇌물로 썼다는 점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존심의 끝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두 사건 모두 배신의 종말을 보여준다. ‘싸구려 티’ 나는 뒷맛을 지울 수 없다.
정서법 위반에 대한 형벌은 단호하다. 오히려 육법(六法)에 앞서 더 예리한 칼날이다. 지난 정권은 이렇다 할 치적이 없다. 하지만 당당함과 깨끗함만은 믿었다. ‘세금 폭탄의 역효과’라는 아마추어리즘도 이해한다. 그러나 도덕성의 보루마저 무너졌을 때 사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변한다. 그들에게 내려야 할 죗값은 이 사회 출입을 금하는 ‘먹통 ID카드’인가, ‘낚시의자’인가. 보이지 않는 단죄가 더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이경우부장@전자신문,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