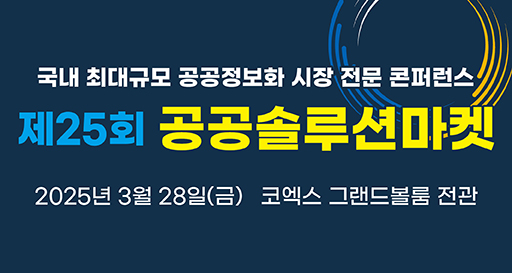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이익이 나지 않으면 팔지 말아라.”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소프트웨어(SW)업계에선 통하지 않는 말이다. 특히 고객 하나가 아쉬운 국내 SW업체엔 배부른 소리로 들릴 뿐이다. 훗날을 기약하려면 손해를 보라도 팔아야 한다. 이것이 SW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정영택 핸디소프트 사장은 달랐다. 올해부터 핸디소프트 경영 일선에 나선 정 사장은 “수익을 내지 못할거면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고 임직원에 지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핸디소프트는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표 SW업체라는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 사장은 매출에 연연하는 사업 구조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임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밤새 일하는데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자세히 들여보니 직원들이 매출에만 골몰해 손해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회고했다.
그는 곧바로 팀장 회의를 소집했다.
“앞으로 실적이 제로(0)도 좋으니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젝트는 수주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선언했다. 업무프로세스관리(BPM) 대표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 맘만 먹으면 BPM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 사장은 고객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욕심이 나는 프로젝트라도 과감히 포기했다. 회사 내부에선 “경쟁업체들이 핸디소프트의 반값으로 치고 들오는데 가격 정책을 고수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우리의 경쟁사는 고객이지 경쟁사가 아니다”며 “고객을 설득하고 제값을 받아오라”고 응수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핸디소프트의 수익은 물론 매출이 동시에 늘어났다. 핸디소프트는 올해 매출 350억원과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핸디소프트는 지난해 246억원 매출과 19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액면만으로도 ‘놀랄 노’자다.
그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가 어렵지 이제 흑자 규모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내년에는 뭔가 일을 낼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전통 SW업계 출신이 아니어서 늘 비주류로 구분됐던 그가 낸 성과여서 더 주목된다.
그는 금융권과 고합을 거쳐 지난 2004년 핸디소프트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핸디소프트의 재무기획통으로 맹활약했으나, SW업계에선 늘 비주류로 분류됐다. 그는 이제 주류들이 부러워하는 비주류가 됐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