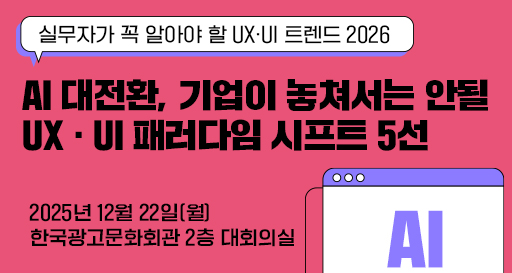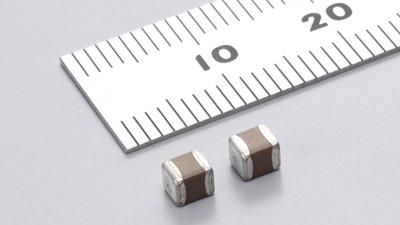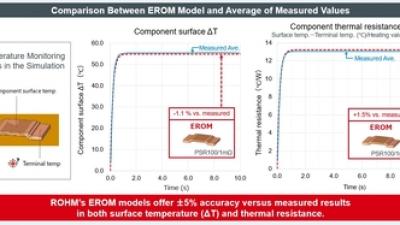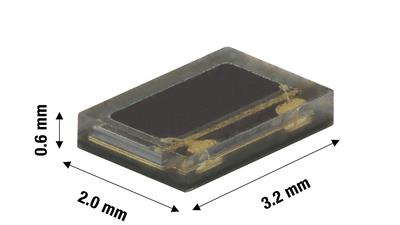97년 IMF사태 이후 뜨거운 불을 지폈던 벤처생태계는 2000년 하반기 미국 나스닥 침몰과 함께 붕괴됐다. 극히 일부 벤처만이 튼튼한 기업으로 살아 남았다. 항간에 ‘귀족 벤처’ 클럽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모임의 멤버인 벤처들조차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오늘날 성공한 벤처를 꼽아 보라고 한다면 열손가락을 꼽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벤처육성 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선회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처럼 오래돼도 튼튼하게 살아있는 중량급 벤처를 더 많이 길러 보자는 의미로 읽고 싶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벤처활성화 대책과 1조 모태펀드 지원정책에 따른 환호성 속에 묻혀버린 희망사항이 새싹들처럼 머리를 내민다.
벤처캐피털(VC)들의 투자와 경영권 참여 본격 허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벤처생태계 내부의 변화인 셈이다.
그러한 산·학·연 현업의 요구는 △객관적 기술평가의 필요성 △연구원 창업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우량 벤처캐피털 육성 주장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L사장 아니면 그 가격에 안 파는 건데 L사장 얼굴 보고 팔았지요.” “이전에 있던 회사는 내가 발명한 기술의 가치도 전혀 모릅니다. 모 휴대폰 회사에서 가격을 네고하자고 왔는데 가격을 모르겠네요.” 휴대폰과 DMB기술을 가진 IT분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과연 다른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은 예외일까. 벤처캐피털 업체가 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돼 있다는 말이다.
벤처캐피털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받아 기업에 투자할 때 그 많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연구원 창업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의 목소리도 제대로 정책 당국에 전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간판 IT연구소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들도 창업, 즉 스핀오프를 원하지만 제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다. 공공성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창업해 기존 민간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에 대한 합당성, 연구원 창업시 요구되는 객관적 평가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벤처생태계 내부의 마인드도 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벤처캐피털들이 스스로 기존 시장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점은 생태계 변화에 따라 업계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캐피털들은 흔히 1차 투자 후 2차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기업에서 빠집니다. 2차 투자자들은 3차 투자를 유치하면서 빠지고 결국 최후의 투자자들은 상투를 잡은 증권투자자들처럼 되어버리지요.”
기업들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캐피털들을 두려워하며 바뀌기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벤처생태계 변화를 조금씩 수용하는 것도 진정 건강한 벤처를 키우는 힘이다.
우리 정책 당국도 벤처활성화에 성공함으로써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벤처 내부의 소리를 결코 흘려 듣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살아남고 성공해서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강한 벤처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구부장@전자신문, jklee@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소형가전 돌파구 찾기
-
2
[ET시선]반도체, 상품과 전략 무기
-
3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43〉2026 AI 전망, 이제는 일하는 '에이전틱 AI'시대
-
4
[ET톡]과기계 기관장 공백 언제까지
-
5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20〉AI 주치의 시대 열려면-한국 의료 혁신의 첫 단추는 API 개방
-
6
[관망경]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바란다
-
7
[ET단상] 나노 소재, AI로 '양산의 벽'을 넘다
-
8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문서의 새로운 가치: '보관'을 넘어 '활용 자산'으로
-
9
[전상욱의 AX시대의 고객경험]〈5〉2026년 트렌드로 읽는 AX시대 고객 경험
-
10
[박영락의 디지털 소통] 〈42〉부천시와 충주시, 지자체 디지털소통의 기준점을 제시하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