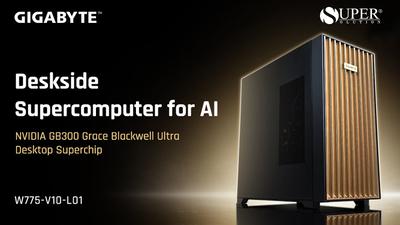조선왕조실록은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0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총 1893권 888책으로 양이 방대해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망라돼 있다. 이처럼 귀중한 조선왕조실록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역사 기록물에 대한 우리 선조의 애정과 치밀한 배려 때문이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등 네곳의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토록 했다. 이 덕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다.
우리정부는 자료관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선시대 4곳에 설치됐던 사고 대신 사이버 공간에 ‘디지털 사고’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 디지털사고가 완성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사료의 소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종이서류로 보관해 온 기록물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영구 저장할 수 있고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보다 쉽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호사다마(好事多魔)인지는 몰라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정부 기관간 알력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 추진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놓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중재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3000억원 정도 추산되는 관련 시장을 놓고 전문업체와 SI업체간의 갈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기관의 주도권 다툼이나 관련 업계의 이익에 앞서 자료관구축사업은 우리나라 기록물 보관과 사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역사(大役事)라는 인식이 앞서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조때 마지막 남았던 ‘전주 사고’마저 유실시키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부 이창희 차장 changh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