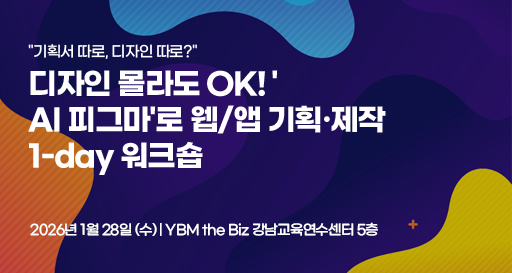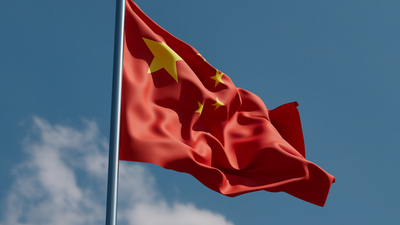톈진에서 이동통신을 주제로 처음 열린 아시아 4개국간 IT협력포럼은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첫 모임에서 어떤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아시아 IT산업포럼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키로 한 것은 이를 증명한다.
포럼을 정례화시키기로 한 것은 IT산업을 공히 국가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동북아 4개국간에 민간차원의 협력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들 4개국은 역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경제적으로, 특히 IT산업에 있어서는 경쟁자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포럼 발족 의미=아시아 IT협력포럼 발족의 가장 큰 의미는 작게는 동북아 IT경제권, 크게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톈진포럼에서 각국은 중국이 이동통신산업을 필두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IT시장과 공급기지가 될 것이라는 데 의의를 달지 않았다.
CDMA 종주국인 한국을 비롯해 세계 최대 전자산업국인 일본과 컴퓨터왕국인 대만 등은 아직까지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생산기지로써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이제는 생산기지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조만간 미국에 못지않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단순조립형태의 협력관계에서 더욱 진전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측이 미국과 유럽의 생산기지를 폐쇄하고 30억달러를 들여 중국에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기지를 세운 미 모토로라측을 이번 포럼 연사로 초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배경=아시아 IT산업포럼 태동의 배경은 중국의 급부상과 그에 따른 3개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주된 배경이다. 중국은 이미 IT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3국에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 IT경기 침체에 따라 3국은 모두 수출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탈출구로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도 IT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이라고 판단, 이제는 자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유치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얼마 전 한국과 일본은 공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서 IT분야를 희생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마늘파동으로 휴대전화 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뻔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공식적인 경제협력 채널이 없어 불편하기 짝이없다. 대만 또한 자국기업의 50%가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뚜렷한 공식채널이 없는 실정이다. 민간차원의 IT포럼은 양국에 비록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공식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중국과 동북아 3국은 그동안 개별차원의 민간교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투자나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공식적인 민간교류 채널이라는 안전판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과제와 전망=중국을 제외한 3개국은 과감한 기술이전에는 난색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중국이 기술력까지 겸비한다면 자국 IT제조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한단계 발전된 협력관계 즉, 과감한 기술이전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각국의 실정과 전략에 따라, 그리고 중국측의 시장개방과 같은 협조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입장에서 보면 CDMA방식 이동통신서비스 확대와 단말기 내수판매 허용 등이 기술이전 보폭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변수다. 또 3국과 중국과의 문제 외에도 한국·일본·대만 3국은 공급과잉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메모리·LCD 분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시아 IT산업포럼에서는 이같이 이해관계가 다른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풀 수 있는지, 민간차원의 합의를 어떻게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았다. 또한 각국 민간대표들간의 활약여하에 따라 교역 당사자들인 개별 민간업체들의 참여도와 지지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것이 포럼의 발전과도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2025 10대 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종지부
-
2
샤오미, 초경량 청소기 새해 1월 출시…'9만원대·860그램'
-
3
AI 강국의 길…'한국형 필승 카드'로 연다
-
4
SK하이닉스, 차세대 '맞춤형 HBM' 개발 방향 수립…“BTS로 세분화”
-
5
신한카드, 애플페이 연동 초읽기
-
6
삼성전자 새해 HBM 생산능력 50% 확대… 'HBM4'에 투자 집중
-
7
과기정통부, R&D 8.1兆 투자…“혁신성장·AI 3강 도약 정조준”
-
8
K제약바이오, 병오년 첫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출격
-
9
챗GPT vs 클로드 vs 제미나이 vs 퍼플렉시티 vs 그록… 14만 대화 분석했더니 '이 AI'가 1등
-
10
새해 'ERP 뱅킹' 급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대거 등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