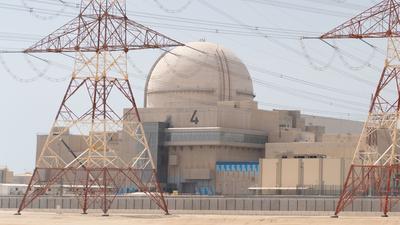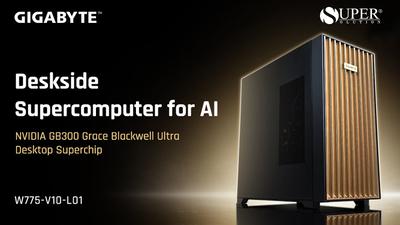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보다 월급 봉투가 두꺼운 상황이 비일비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막이 올라가면서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에 정보화·디지털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이같은 바람은 21세기들어 더욱 풍속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은 과거 생소하기만 하던 신조직문화인 직급파괴제 등을 외국에서 앞다퉈 도입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이같은 일이 우리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 직급이 신분을 보장하던 시대는 종언을 고하기 시작했다. 학력과 연공서열, 경험, 수직적 계층구조 등을 기반으로 한 인사트렌드에서 능력, 신지식, 성과, 수평적 계층구조 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홍과장님」 「홍부장님」이 아닌 「홍길동님」 「홍팀장님」 등으로 불리면서 평생직장에 기초한 단계별 직급체계는 의미를 상실하고 단계별 승진이 비전이 되던 모습은 직장인들 머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직급파괴 현상은 대리급 직원이 과장급 직원보다 월급봉투를 두껍게 받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일 한 만큼 월급을 받아간다」는 인식이 우리 조직문화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연공 서열식의 직급을 폐지하거나 다단계 직급단계를 단순화하고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는 이같은 직급 파괴 현상은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30대 초반 은행장을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신분 질서의 재정립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식 직급파괴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직무와 창의력, 신지식 등의 중요성에 따라 급여체계가 결정되는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하급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상급자들도 하급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층 분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실제 LG정유는 최근 부장·차장·과장 등의 직위를 없애고 팀장과 부팀장 등 2단계로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대리급을 벗어나면 승진개념이 사라지고 역할에 따라 팀장과 부팀장이 된다. 과거 13개던 직급도 7개로 대폭 줄여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했다.
한솔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이 과장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9년에서 최소 3년으로 줄이는 파격적인 승진제도를 도입했다. 사원, 대리, 주임 각 3년을 근무해야 승진의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단계별로 1년마다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99년 승진 최소 연한을 폐지하고 일정기한내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급정년제를 도입, 일정기간내 승진하지 않으면 승진기회를 박탈했다. 롯데마그넷도 근속연수가 15∼20년차인 부장급에서 임명하던 점장을 10년차 과장급에서 임명하는 파격적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꿈인 임원도 직급이 파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LG·두산·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평균 6단계인 임원직급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단축했으며 삼성그룹도 올해 이 대열에 가세했다.
임원직급이 축소된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빠른 대신 이에따른 책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사든, 전무든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공기업도 직급파괴가 진행중이다. 외교통상부는 현행 7단계의 직급을 완전 폐지하고 직급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인재를 발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는 처음 처·부 단위 조직을 폐지하고 팀제로 재편하는 동시에 성과급형 연봉제를 전면 도입했다.
편하고 월급 많고 잘릴 염려도 없는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서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자는 것이고 조직 외부에서는 민간기업들과 겨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같은 직급파괴와 연봉제, 파격적인 승진인사제도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도입하는 기업과 공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가 「지구촌」처럼 좁아져 선진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도전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조직풍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제개혁은 이제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2000만원대 BYD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
-
2
이란 시위·파월 수사에…비트코인 '디지털 피난처' 부각
-
3
테슬라, '모델3' 가격 인하…3000만원대
-
4
반도체 유리기판, 중국도 참전
-
5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해외서 아틀라스 집중조명
-
6
신제품이 가장 비싸다?...中, 로봇청소기 출고가 하락
-
7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8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패자부활전' 놓고 KT·모티프·코난 등 고심
-
9
민투형 SW, 5년째 사업 난항… 신청 자체가 적어 참여 유도 '동력 확보' 시급
-
10
배터리 광물 價 고공행진…리튬·코발트·니켈 동시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