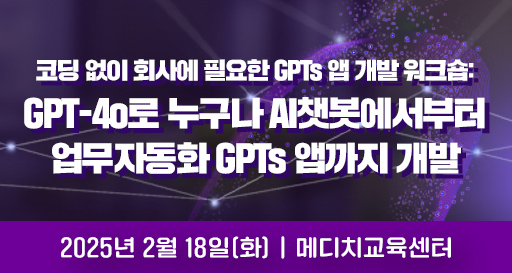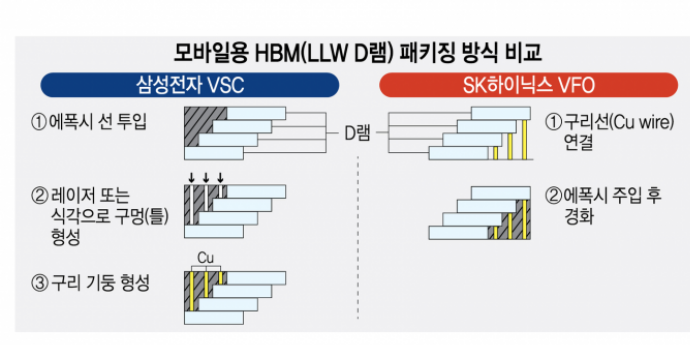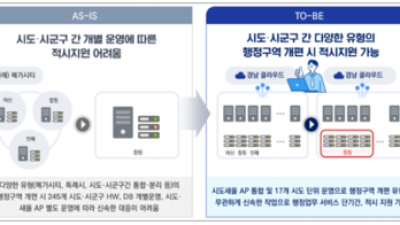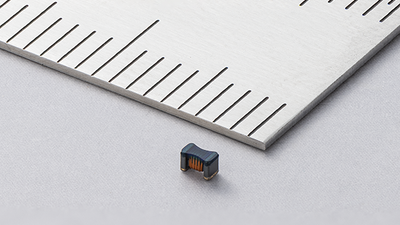나는 여비서 김양희 앞에 서서 머뭇거리면서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홍 사장은 나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노 과장은 그런 대로 나를 두둔하고 있었다. 나는 3년 전에 이 회사를 떠날 때 군복무를 마치면 다시 복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것은 허성규 실장과 최영만 사장이 원했던 일이고, 기술자들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었다.
『최영준 씨는 전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네요?』
김 비서가 나에게 말하면서 웃었다. 그녀가 말하는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좋은 느낌으로 말하는 것임은 틀림없었다.
『김양희 씨도 더 예뻐졌군요. 아직 시집은 안 갔어요?』
『시집 갔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최영준 씨가 중매라도 해서 노처녀 좀 구해주세요.』
전에도 그랬지만 김양희를 보면서 느끼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최 사장과의 일 때문일 것이다. 비서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녀와 말장난 같은 몇 마디를 주고받고 있을 때 노 과장이 나왔다. 노 과장과 나는 복도로 나와서 승강기 앞으로 걸어갔다. 가면서 노 과장이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참, 야단이야. 우리 사장님은 컴퓨터의 기술개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식품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분이라서 그런가요?』
『경영자는 어떤 물건을 팔았든 그 상품에 따른 감각을 알아야 하는데, 홍 사장은 판매 쪽에 너무 신경을 써요. 컴퓨터 산업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최영준씨?』
『저도 그 점에는 과장님과 동감입니다.』
『최영준씨는 군대생활하면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면서?』
『네.』
『사병 신분으로 유학까지 다녀온다, 대단한 특혜인데?』
『군인 신분으로서보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내 준 것이죠, 뭐.』
우리는 승강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기술실로 들어가자 방안에는 윤대섭 혼자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은 자리에 없었다. 모두 해야 네 명의 기술자들이 기술실에 있는데, 다른 두 명은 창고로 가서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기술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 패권의 새로운 질서
-
2
[ET단상] 양자와 AI 시대, K보안 도약을 위한 제언
-
3
[ET톡] 퓨리오사AI와 韓 시스템 반도체
-
4
[ET톡] AI와 2차 베이비부머의 미래
-
5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4〉AI '앱 경제'를 '에이전트 경제로' 바꾸다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5〉고독한 사람들과 감성 AI
-
7
[부음] 김동철(동운아나텍 대표)씨 장모상
-
8
[부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씨 장모상
-
9
[사설] 보안기능 확인제품 요약서 사안별 의무화 검토해야
-
10
[ET시선] 국회, 전기본 발목잡기 사라져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