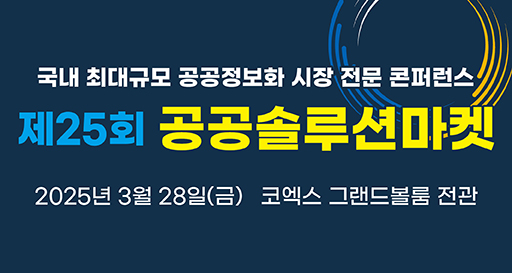용산전자상가는 올해로 개장 10주년을 맞았다. 10년사이에 전자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시장이 급팽창했다. 유통시장이 개방됐고 할인점, 창고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가격에 경쟁이 붙었다. 올해초에는 경영난으로 상당수의 유통업체가 문을 닫는 아픔을 겪였다. 10년전의 상황과는 판이하다.
올해 3월 서초동에 국제전자센터가 개장했다. 내년 3월에는 더 큰 규모의 테크노마트21이 개장된다. 구로동에 부품 전문 중앙유통상가가 개장했고 이어 고척동에도 1.2, 3전자타운이 개장된다. 이 모든 상가가 용산전자상가의 경쟁상가이다. 10년전 세운상가와 용산전자상가로 대별되던 전자상권이 나뉘어지고 있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용산전자단지조합」은 이러한 경쟁의 위기감에서 비롯돼 설립된 것이다. 타 상가보다 경쟁력이 있는 상가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책이다. 지난해 「용산전자단지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방향타를 조합으로 돌린것도 보다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정부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같은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가급적 관계기관의 끈을 달고 다니는 점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용산전자단지조합의 사업주체는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상가의 문제점을 가장 잘알고 해결방안도 가장 확실하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다. 집단이 갖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문제를 의식해 조합을 설립한다해도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조합 설립 이전에 각 상우회가 주축이 돼 상가이미지 개선작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불법SW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씻기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일부만 참여했을 뿐 그 뿌리를 캐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자체적인 강력한 규제의 힘은 없었다. 또 용산전자상가가 동양 최대규모의 전자상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동양 최대라는 말에 걸맞게 세계화 되지는 못했다. 외국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매출과 직결시키지도 못했다. 관광특구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용산전자상가에는 전자와 관련된 제품이 없는 것이 없다』 『싸다』라는 말이 「집안 소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거센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세계화가 되어야할 상가는 정작 「국내용」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요즘 용산전자상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면 자구노력의 부족도 들수 있다.
이러한 「깨끗한 이미지의 상가」를 만드는 일과 「세계화된 상가」를 만드는 일은 조합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이다. 이에 앞서 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한 상가전체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참여에 머뭇거리는 다수의 상가 상인들을 흡수하는 것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준비위원들의 할 일이다. 따라서 조합원 확보를 위해 내년 사업계획은 단기간에 시행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모아져야 한다. 대다수의 상인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는 까닭이다. 이후 장기적인 교육사업, 공동구매 판매사업 등으로이 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힘의 규합을 위한 조합은 필연적이다. 필연성에 대한 상인들의 참여는 조합 설립후 「첫발」에 있다. 「공존」의 틀을 마련하느냐 파행적으로 운영돼 「공멸」의 길로 들어서느냐는 이제 조합상인들의 몫이다.
<이경우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8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