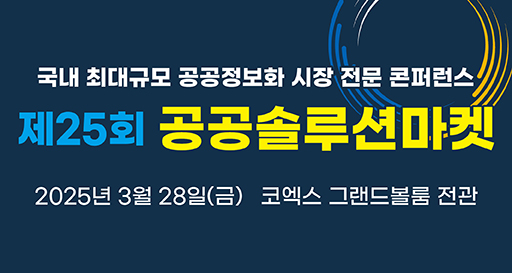미국과 유럽이 디지털 지상파TV 방송기술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 디지털TV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에 자국의 기술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제공 경쟁은 미국과 유럽방식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디지털TV방송이 시작되면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장비를 갖춰야 하고 시청자들은 디지털 수상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 기술의 채택은 관련기기 등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커 금전적인 이득이 보장되는 데다 기술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기술판매 접전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호주 등 디지털TV방송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는 국가들. 지금까지 뉴질랜드가 유럽시스템, 한국이 미국시스템에 각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외에는 서로가 뚜렷한 우위를 보이는 국가를 확보하 못한 상태.
중국의 경우 지난 8월 미국과 유럽 양측이 모두 베이징을 방문했다. 미국은 만리장성에서 실연회를 가졌고 ,유럽도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홍보에 나섰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미국과 유럽 외에 아직 디지털TV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없다. 양측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TV 방송시스템 기술은 각각 일부 회사에서 핵심 기술특허를 갖고 있다. 미국은 그랜드얼라이언스시스템, 유럽은 디지털 비디오브로드캐스팅시스템(DVB) 등이다. 이들 회사는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다. 유럽의 DVB에 미국기업인 휴렛패커드(HP)가 참여하고 있으며 톰슨과 필립스의 경우 양측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서로 다른 오디오시스템, 전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보다 유사점을 더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뒤로 밀려난 이후 디지털TV는 사실상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왔다. 유럽지역은 고선명 디지털TV방식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올 봄 호주방송사가 고선명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유럽측이 방향을 바꿨다. 유럽측은 자신들의 시스템으로도 고선명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워 본격적인 마케팅 작업에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 디지털TV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4년 전의 일이다. 유럽정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아날로그 고선명 TV연구가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연구포기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정은 DVB그룹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TV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 주었다.
유럽의 디지털TV 개발이 끝난 것은 미국규격이 컴퓨터산업계의 항의에 부딪혀 1년여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때였다. DVB는 어렵지 않게 기술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게 될 수 있었고 미국이 컴퓨터업체를 달래고 있는 동안 마케팅에 나서 미국의 에코스타를 포함, 직접 위성방송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해 나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어느국가에서도 고선명 TV방송을 실시하려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최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시장은 위성이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들 가운데 절반이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다. 따라서 이 엄청난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한 경쟁이 이제 불붙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고선명TV방송을 위한 기술적인 변수를 추가, 결점을 보완했다고 밝혀 지상파 시장공략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 DVB측은 이미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위성시장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지상파 공략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면 미국측 업체인 AT&T에서는 고선명TV를 가능하게 하는 진짜 기술은 하나뿐이라며 미국방식의 기술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살아남기 보다 장악하기 위한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