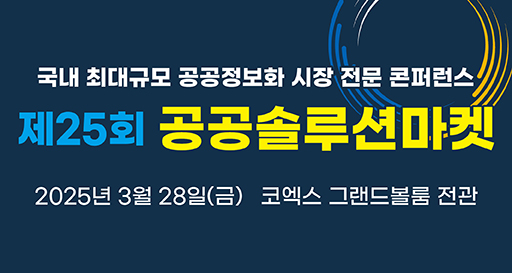한 주에 적으면 1편 많으면 3편의 칼럼을 쓴다. 핵심만 잡으면 어렵지 않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능할까. 나만의 요령이 있다.
여러 칼럼을 순서대로 쓰지 않고 동시에 쓴다. 칼럼 A를 쓰다가 마무리 않고 칼럼 B, 칼럼 C로 넘어갔다가 돌아오길 반복한다. 아이디어 융·복합에 따른 시너지를 노린다. 치매도 예방한다. 무미건조함을 피하고 생동감을 내기 좋다. 양자역학이 인기다. 양자는 입자이며 파동이다. 하나의 양자가 중첩해 여기저기 존재한다. 양자를 얽은 다음엔 멀리 떨어트려 놓아도 동시에 반응한다. 1개 칼럼의 아이디어는 양자처럼 중첩돼 다른 칼럼에서도 존재한다. 아이디어가 양자처럼 얽히고 다중우주처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소화한다. 미국 드라마도 영감을 주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인기 출연자를 떼어내 별도의 '스핀 오프' 드라마를 만든다. '베터 콜 사울'은 '브레이킹 배드'의 스핀 오프 드라마다. 칼럼 중 반응이 좋은 부분을 떼어 뼈와 살을 붙이고 디테일을 더하면 별도의 칼럼이 된다. '원소스 멀티유스'도 가능하다. 칼럼을 모으면 훌륭한 강연자료가 되고 책으로도 쉽게 얽을 수 있다.

많은 칼럼니스트가 최고의 지식인임을 뽐내며 현안을 알리고 교훈을 주려 글을 쓴다. 어떤 칼럼은 미국을 따라 제때에 금리를 올리지 못해 물가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금리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가계부채 폭발 등 부작용은 없었을까. 모든 병폐의 근원이 규제라며 무조건 규제 타파를 외치는 칼럼도 있다. 규제를 없애면서 생기는 폐해에 대해선 입을 닫는다. 격렬하게 말하는 건 좋지만 또 다른 문제를 외면한다.
칼럼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쓰진 않는다. 그건 기자가 할 일이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해서도 안된다. 그건 교수가 할 일이다. 흥미를 잃게 되고 읽는 것이 곤욕이 된다. 논리를 갖춰 상대방을 100% 압도하면 그 설득은 실패한다. 논리로는 납득되지만 설득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대략 70%만 설득하면 된다. 나머진 상대방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낸 듯 넘어와야 한다. 기발한 생각, 독특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재미가 우선이고 교훈은 그 다음이다.
칼럼 도입부에 신경을 쓴다. 좋은 칼럼도 도입부가 허술하면 읽고 싶지 않다. 도입부를 재미있게 읽은 독자는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읽는다. 옛 대중가요를 들어보라. 전주가 길다. 처음 들으면 경음악인줄 안다. 과거 지상파방송처럼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송출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 지금은 인터넷시대다. 재미없으면 곧장 다른 채널로 넘어간다. 칼럼 도입부도 영화의 앞 5분처럼 강렬하거나 신기해야 한다. 역사, 문학, 미술 등에서 흔치않은 이야기를 끌어 쓴다.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게 만든다. 도입부 소재는 칼럼 주제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일수록 좋다. 주제와 기발하게 연결되면 흥미는 배가된다.
좋은 칼럼을 위해 메모하는 습관이 좋다. 유유상종을 피해 다른 직업, 세대와 만난다. 모르는 얘기에 귀 기울인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다. 받아먹기만 하니 이기적이긴 하다. 말은 많은데 알맹이가 없으면 듣기 불편하다. 건강 위기극복 영웅담을 웅변하고 자식, 손주, 돈 자랑하면 답이 없다. 어떤 분은 꾹 참다가 헤어지는 찰나에 그 보따리를 풀고 간다.
간결한 문장이 좋다. 접속사 없이 글이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숏츠, 릴스처럼 읽힌다. 아름다운 문장은 그림보다 예쁘다. 말하듯 쓴다. 맥락 건너뛰기도 괜찮다. 건너뛴 공간은 생각할 자리를 내어준다. 끝맺음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꿈에서 생각날 정도의 임팩트를 넣는다.
칼럼은 독자를 위한 것 이전에 거친 세월을 견뎌온 나를 위한 것이다. 마음과 몸으로 받아낸 삶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소리 없는 비명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디지털 생활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