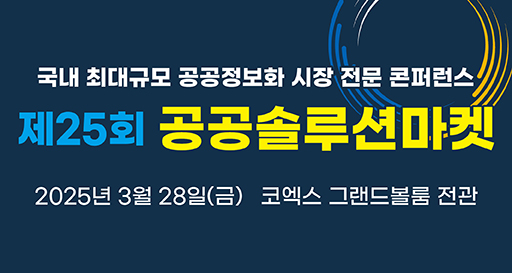2022년 제약·바이오업계 기업공개(IPO) 성적표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지난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년보다 약 절반 줄어든 13개사에 그친다.
상장 회사 숫자뿐만 아니라 총 조달 규모, 평균 공모조달액 모두 예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속출했지만 이들은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몸값을 낮추더라도 상장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때 이상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가혹한 환경을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금리인상·경기침체 우려에서 비롯된 제약·바이오 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증시의 기술특례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래를 담보로 한 유망주들이 성장 가도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넘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의약품 및 혁신 신약 개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만큼 투자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은 수요를 줄일 수 없는 필수 소비재인 데다 고령화 사회로 혁신 신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급격히 성장, 5년 뒤 세계 시장 규모가 1조8000억달러(약 22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주요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역량인 신약 개발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70% 정도에 불과하며, 6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한 중국의 기술력도 한국보다 1년 앞선 상태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업계는 올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 신약 '롤론티스'(에플라페그라스팀)는 지난 9월 국산 신약으론 여섯 번째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부문 바이오신약 부문에서는 최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글로벌 3상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유한양행은 2023년 1분기 1차 치료제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고, FDA에도 허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최근 미국에서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에 착수했다. HK이노엔은 이번 3상을 시작으로 케이캡의 미국·유럽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신약 연구개발(R&D)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하는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업계에서 후발주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민·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약 개발은 10∼15년의 시간과 수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5000∼1만개의 후보물질 가운데 단 1∼2개만 신약으로 상품화될 정도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블록버스터 신약을 한번 개발하면 연간 10억달러(1조2600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제약 주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R&D는 계속돼야 한다.
올해 경기침체와 불황이 예고되며 제약·바이오업계의 돈 줄도 급격히 마를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성공 가능성, 긴 개발 기간을 감당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투자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어찌보면 '옥석가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산업의 역량과 캐파(Capacity)가 후퇴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꿈을 먹는 사업'으로 불린다. 개발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건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활약이 한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종현 에이온인베스트먼트 대표 jhl@aoninv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