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과 이론이란 두 영역은 잘 섞이지 않는다. 당장 기업 강좌라도 개설하려면 이 두 전략은 맞부딪친다. 한 편은 실무를 통한 학습이 최선이라 본다. 다른 편은 지식은 체계를 갖춰 전달되고 학습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실무에 따라 강좌를 짜면 교과서 이곳저곳이 비기 마련이다. 반대로 교재를 따라가다 보면 '이걸 어디에 쓸까'라는 의문도 든다. 종종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평도 피할 수 없다. 그러자니 교재의 편제를 따라가되 실무나 사례를 넣는다. 결국 해법은 이론과 실전이라는 양손잡이에서 찾은 셈이다.
'혁신 역설'이라 불러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토록 혁신했지만 수익률은 거꾸로 간다고 한다. 내로라하는 기업도 종종 실패하고, 한때 성공했더라도 반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탓은 아닐까.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블루오션 전략을 쓴다면서 정작 레드오션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학자가 '생각의 오류'를 지적한다.
예시는 얼마든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고객지향' 대 '비고객지향'의 차이다. 예전 IBM이 컴퓨터를 처음 만들던 시절 하드디스크는 14인치가 대세였다. 컴퓨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크기는 문제가 안 됐다. 그러다 8인치 디스크 저장용량이 향상되고 미니컴퓨터가 등장하자 14인치 시장을 지배하던 모든 기업이 도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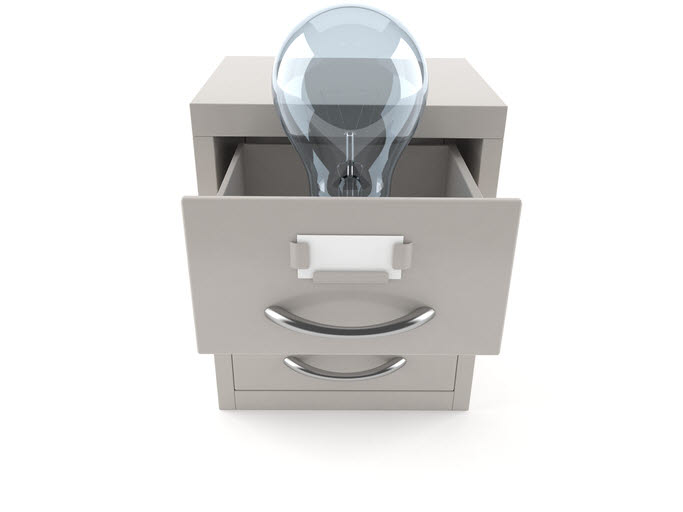
그러다 얼마 뒤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와 5.25인치 대세가 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때 시게이트가 새 강자로 등극한다. 그러다 3.5인치 드라이버가 나온다. 시게이트는 자신의 3.5인치를 기존 고객에게 보여 줬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넣기에 저장용량이 적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14인치 때나 8인치 아니 5.25인치 때와 같았다. 시게이트는 시장을 코너와 퀀텀에 내준다. 기존 고객의 말을 경청했지만 한편으로 미래 시장의 새 주인을 예측하지 못한 셈이었다.
또 다른 생각의 오류도 흔하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전 교수는 자신이 창안한 와해성 혁신을 놓고 “이 이론은 그토록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개념은 잘못 이해되고, 원칙은 잘못 적용된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텐슨은 생전에 우버가 와해성 혁신인지 자문하기도 했다. 그의 결론은 '아니다'였다. 이것이 기존 기업에 의해 간과된 두 가지 발판에서 주류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자신의 이론에 배치된다고 봤다. 크리스텐슨의 설명을 빌리면 그건 분명 성공이지만 와해성 혁신이 만든 성공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버를 이렇게 칭하든 다른 이름을 붙이든 크게 상관할 바 없어 보인다. 뭐라 부르든 우버를 따라 하면서 성공하면 그만일 수 있다. 단지 이때 우리는 와해성 혁신이라는 렌즈는 잃을지 모른다. 물론 와해성 방식이 말하는 놀라운 성공도 영영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지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탐험가의 경험, 어떤 이는 나침반에 의존한다. 그러나 종국에 필요한 것은 지형도일 것이다.
이런 이유일까. 누군가는 '아카이브'라고 부르는 자신만의 문서보관소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 거기엔 이런저런 혁신 방식이 언제나 필요할 때면 꺼내 들 수 있도록 색색의 포스트잇에 적힌 메모와 함께 분류돼 있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