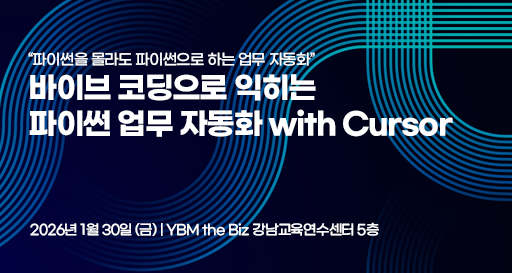그래핀(Graphene)과 함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았던 게 있다. 이황화몰리브덴(MoS2)이다.
그래핀은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강철보다 200배나 강하지만 반도체로는 적용하기 힘들다. 반도체로 활용하려면 적정 수준의 저항이 필요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밴드갭(전자의 에너지가 갖는 차이)’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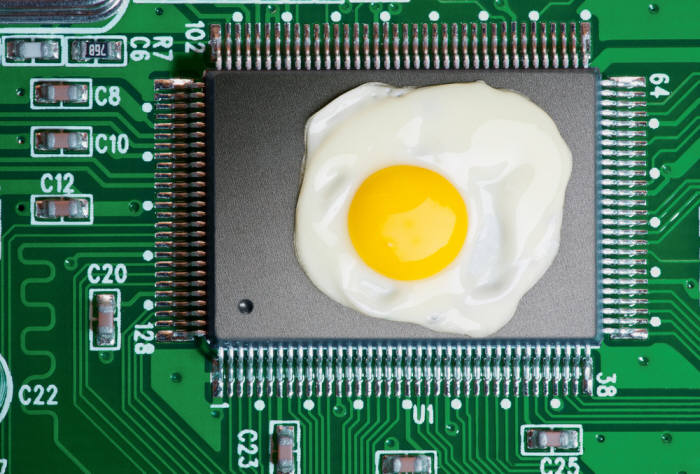
반면에 이황화몰리브덴은 얇은 층 구조라 박막 제작에도 유리할 뿐더러 그래핀과 달리 밴드갭이 존재한다. 그래핀처럼 2차원(2D) 구조로 이를 단일 겹으로 만들면 빛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발광효과가 우수하고, 이는 얇아질수록 강해진다. 투명성과 유연성이 높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구동회로를 구현하는 핵심 소자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이황화몰리브덴으로 200도(℃) 이상에서 견디는 박막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산업용 기기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용 터빈 엔진이나 석유화학용 기기에 쓰이는 센서 및 전자기기들은 고온 등 극단적인 환경에 잘 견뎌야 한다. 우주항공이나 석유화학 등 산업용 전자기기에서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고온에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냉각 시스템이 이를 보완해왔다.
이황화몰리브덴 박막 트랜지스터가 22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동작한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최근 ‘응용물리저널(Journal of Applied Physics)’에 발표했다. 여기에 두 달 동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다.
연구진은 표준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해 실리콘 기판 위에 이황화몰리브덴 박막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고온 실험을 거쳤다. 1~3개의 레이어로 이뤄진 트랜지스터와 15~18개 층으로 이뤄진 트랜지스터를 서로 견줬다. 그 결과 레이어 층이 몇 없는 박막 트랜지스터가 고온에서도 비교적 높은 전자 이동성을 보였고 내열성도 강했다.
이어 연구진은 30~200도 환경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전압 기술을 활용, 이황화몰리브덴 박막 트랜지스터의 직류 전류를 측정해 전류-전압 특성과 기능적 성능을 점검하는 데 나섰다. 임계 전압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기능적 성능은 온도가 올라가도 유지됐다.
이황화몰리브덴 박막 트랜지스터가 고온에서 기능을 잃지 않는 것은 전자이동도와 임계전압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기 채널을 오가는 전류가 줄어들어 전자 이동도가 감소하는데, 이와 동시에 임계 전압이 작아져 전류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즉 고온에서 이황화몰리브덴 박막 트랜지스터는 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이황화몰리브덴 트랜지스터를 제어 회로와 센서에 적용한 실제 전자기기를 고온에서 한 달 이상 작동시켰다. 두 달간 이를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전자기기는 온도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고,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연구진은 향후 화학적증기증착(CVD) 등 다른 공정에서 이황화몰리브덴 트랜지스터와 회로를 형성해 이들이 갖는 고온에서의 기능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