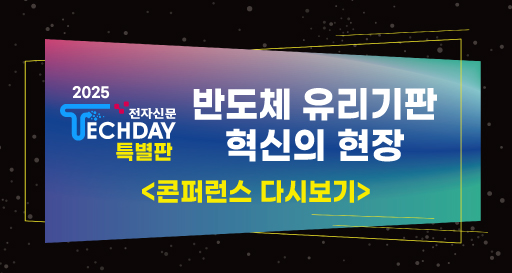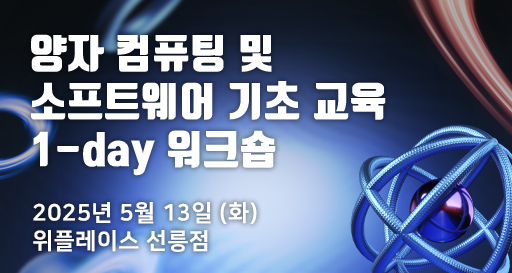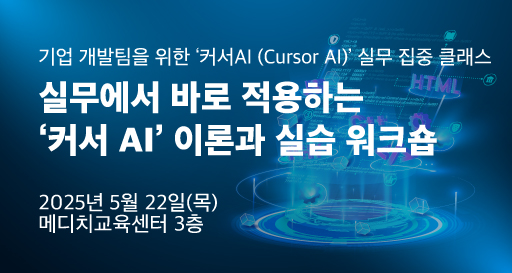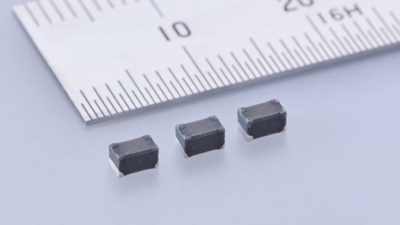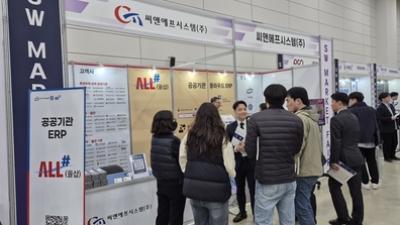강하(降下)하는 군인은 두 개의 낙하산을 등과 가슴에 멘다. 주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조낙하산을 휴대한다. 낙하산줄의 굵기는 4㎜다. 이 줄이 버텨낼 수 있는 무게는 250㎏ 정도다. 군용 낙하산과 몸에 착용한 하니스 사이에는 30개의 줄이 연결돼 있으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줄이 끊어질 일은 없다.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덕에 강하 시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일도, 줄이 끊어질 일도 없다. 그 만큼 낙하산은 안전하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낙하산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낙하산 본연의 의미, 다른 하나는 채용이나 승진과 같은 인사에서 배후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낙하산을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고위직에 안착하는 행위를 낙하산에 빗댄 것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와 낙하산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적의 종심부에서 맹활약을 펼쳐야 하는 특수부대원을 투입하는 데 엉터리 낙하산이 지급될 리 만무하다. 또 특수부대원이 투입된 후에는 그 전투력을 최대로 활용해야 하니 나 몰라라 방치할 일도 없다. 낙하산 인사도 다를 바 없다. 권력이 보장하는 안정적 지위를 가졌다. 권력이 용인하는 또 다른 권력도 지녔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하지만 전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03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를 갑절로 키운 건 낙하산 인사와 그들에 의한 방만 경영이다. 대선공약 남발로 씀씀이가 커진 정부의 뒷수습을 공공기관이 맡았다. 기업도시·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돈을 쏟아 부은 LH가 그랬고, 4대강·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그랬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라고 공공기관 부실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가 보은(報恩)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렸고, 그 낙하산 인사는 배후를 믿고 방만 경영과 부실을 키웠으니 둘은 공범이다.
집권자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 코드가 맞는 인재를 핵심 공공기관장에 앉히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자질 즉, 전문성과 능력이 최우선이 아닌 차선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자질 없는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적지에 임무수행 능력이 있는 특수부대원이 아닌 전투지식 없는 민간인을 투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 소모의 차원을 넘어 전쟁을 망치는 행위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 며칠 전에는 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독을 품었다. 뭔가 바꿀 모양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기관장 교체가 진행 중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낙하산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냉소주의 성향만 키울 뿐이다.
문제의 중심엔 정부가 있고, 문제 해결 주체도 정부다. 국민은 정부의 의지표명이 아닌 달라진 태도를 기다린다. 불현듯 KT가 생각난다. 뜬금 없다고 해야 할까. 공공기관도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 KT가 5년 만에 CEO를 다시 뽑는다. 차기 KT호를 누가 이끌지 궁금해진다.
최정훈 취재담당 부국장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