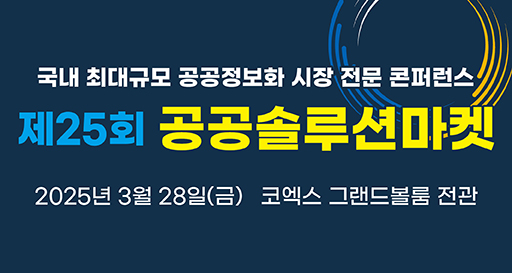중국은 5년 전만 해도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라였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30여년 간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면서 인건비를 줄여 수익성을 확보해왔다.
지난 2007년 이른바 중국의 `신노동법` 제정 이후 중국 내 노동자 임금이 한 해에 13~14%씩 오르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물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자꾸 불어난다. 이 때문에 `탈 중국`을 외치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졌다는 건 인건비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에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도 있다. 픽셀플러스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다가 협력사에서 탈락하며 지난 2008년까지 매출액이 거의 제로로 줄었다.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과 거래를 끊고 중국 중소 폐쇄회로TV(CCTV) 업체 위주로 제품을 개발하고 영업했다.
중국 내에서 현지 중소업체에 일일이 영업을 다닌 결과 단기간에 중국 내 보안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보안카메라 90% 이상이 이 회사 이미지센서를 사용한다. 매출액도 10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현지에서 기술지원인력만 20여명 넘게 채용한 실리콘화일 역시 1000억원대 회사로 성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 협력사에 종속된 회사에 비해 탄탄한 고객사망을 구축했다. 인건비만 따져봤다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
얼마 전 중국에 가서 한국계 회사 지사나 대리점 사람들을 다수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었다. “중국 고객사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아져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없으니 중국 현지 업체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가에게는 인건비는 늘 부담스럽다. 단순히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치부하고 중국을 바라보면 `차이나 리스크`가 먼저 떠오른다. 13억명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을 잡기 위해 현지 인력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면 `차이나 찬스`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