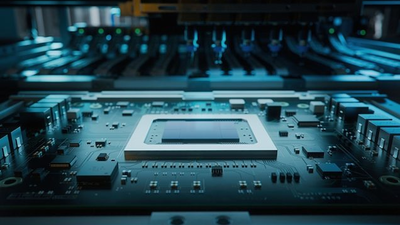전력난, 도대체 언제쯤 풀리나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제때 건설되지 않은 전원설비(발전소·송전망·변전소)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전원설비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전기위원회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허가와 환경부 환경평가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도 정작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 속수무책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민원에 따른 국가 전력설비 구축사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밀양 송전탑은 전력수급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국가 전력망이기 때문이다. 밀양 사태는 정치권과 정부까지 개입하며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됐지만 결말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3년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밀양뿐만 아니라 송·변전 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전기사업자와 지역주민이 대립 중인 지역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전북 군산의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도 2008년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이 멈춘 상태다. 포스코건설이 강원도 춘천에 추진했던 복합발전소, 현대건설의 포항 화력발전소 등도 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중단됐다. SK E&S가 경기도 양주에 추진했던 LNG복합발전소 건설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공사 허가를 받은 민자 발전소 역시 공사 착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부건설이 충남 당진에 건설하려던 500㎿급 화력발전소 두 기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2년 넘게 표류하다 올 초에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지자체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수입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해 발전소 유치를 반기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원설비 예정지 반경 5㎞ 내 거주하는 주민은 특별지원금을 받지만 나머지 주민은 혜택이 거의 없어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을 추진과정에서 주민이나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예상 밖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아무리 사업성이 높다 해도 민원이 예상되면 전원설비 사업추진은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