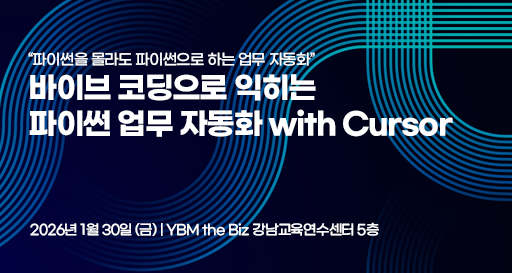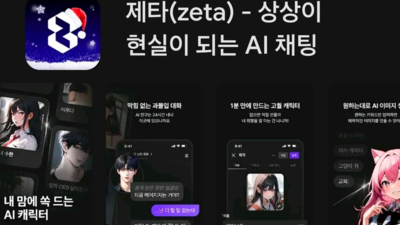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들면서 일부 연구개발(R&D) 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교육과 과학기술부문이 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 교육과학기술부는 5년째인 지금도 겉돈다는 지적이 많다.

과학기술계는 새로 꾸려질 정부에 과학기술 신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며 정책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 창조형 R&D 프로그램 안착 △과학기술인력 10만명 양성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창의 인재 양성 △지식재산 강국위한 생태계 마련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등이다.
과학기술계의 염원이 통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전제하며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펼 것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부총리급 부처 신설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해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는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만족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연구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복잡하게 돌아다니면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연구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연구소에 맡긴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지경부 국가 R&D 과제는 한 때 성공률이 95%에 이르기도 했다. 과제 성공률이 높으면 그 만큼 성실하게 R&D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과는 그 반대다. 성공률을 지나치게 따지면 R&D 과제를 신청할 때부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과제를 기획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R&D에 그치게 된다. 지경부는 몇 년 전부터 정부 R&D 성공률이 95%를 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성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R&D를 확산하기 위해 시스템에 변화를 줬다. 성실수행 개념을 도입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자에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부여했다. 교과부 역시 창의·도전적인 R&D를 장려했다.
새 정부는 연구자가 실패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감독이자 항공업계의 선구자로 알려진 하워드 휴스가 설립한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가 좋은 본보기다. 이 의학연구소는 과제 선정부터 남다르다. 성공하기 쉬운 과제보다는 굉장히 좋은 개발 분야지만 90% 이상 실패할 것 같은 아주 어렵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에 지원한다. 일단 지원분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매년 100만~200만달러를 지원하면서도 연구자가 비용을 어디에 쓰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은 획기적이다. 더 놀랄만한 것은 연구 성과다. 자율이 보장된 만큼 연구에 몰입한 덕분에 2009년까지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15명이나 된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결국 창의적 R&D 문화에서 나온다.
주문정 논설위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