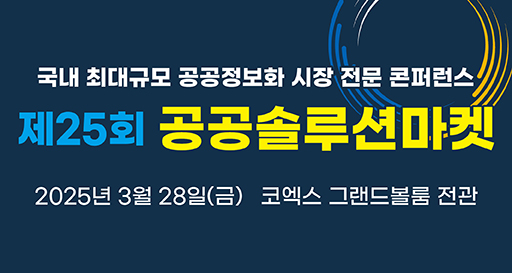녹음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눈부시다. 상쾌한 미풍이 뺨을 스친다. 출근 전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도는 조깅은 하루 일과의 기분 좋은 시작이다. 아파트에 들어와 스마트패드를 켜니 조깅 시간과 칼로리 소모량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화면을 한 번 터치하자 다섯 시간 전 하이드파크를 뛴 친구의 운동량과 비교한 그래프가 일목요연하게 뜬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2년 7월 현재, 뉴욕과 런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풍경이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가 만나 미국인과 영국인의 조깅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주역은 애플도 구글도 아니다. 바로 나이키다.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는 2006년 `나이키플러스(NIKE+)`라는 신기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에 들어 있는 센서가 이용자의 운동량과 패턴을 인식해 수치로 바꾼다. 수치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다.
나이키플러스 초기 반응은 `나이키가 희한한 서비스를 내놨다`가 대세였다. 일부 얼리어답터의 자기 과시 용도에 그쳤다. 나이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스마트 혁명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붐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 빠르게 받아들였다.
나이키는 손목시계 형태의 `퓨얼밴드`를 출시했다. 센서가 파악한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퓨얼밴드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PC와 클라우드로 묶여 있다. 지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나이키플러스 사이트에서 선의의 운동 경쟁도 벌일 수 있다. 자칫 따분함에 빠질 수 있는 운동에 언제 어디서나 재미와 동기를 부여한 나이키플러스는 대성공을 거뒀다. 나이키플러스는 세계에서 700만명이 이용한다. 퓨얼밴드는 미국과 영국에서 출시 즉시 완판됐다.
나이키는 스마트 시대 성공 방정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개별 상품 개발이라는 좁은 시각을 벗어나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기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한 결과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요즘 인터넷 업계 이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뉴스캐스트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통사는 카카오톡이 트래픽 발생의 주범이라고, 조중동은 네이버가 사이비언론의 온상이라고 주홍글씨를 새기기 바쁘다.
시대가 바뀌었다. 사용자는 누가 만든 뉴스인지, 누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인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제는 내용과 품질이 훨씬 중요하다. 수동적 소비자(Customer)는 스마트 혁명을 겪으면서 현명한 이용자(User)로 변신했다. 나이키의 전략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