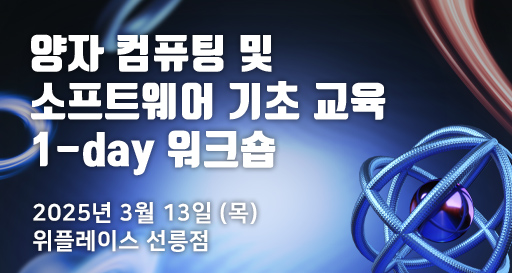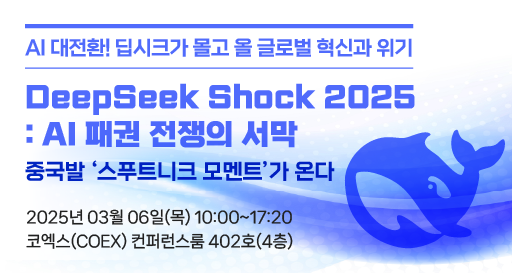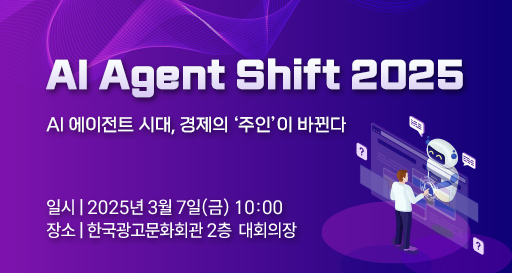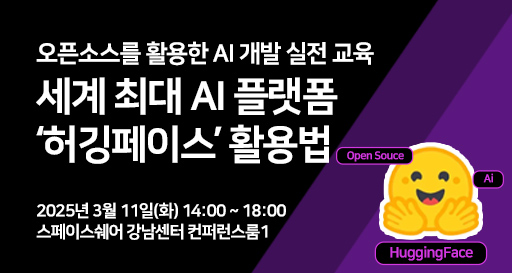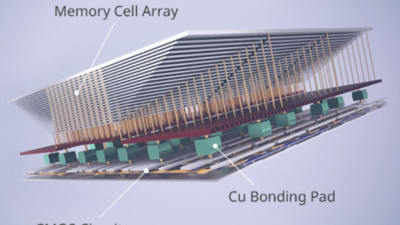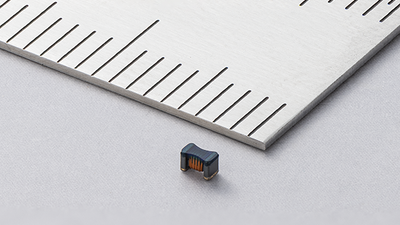정부가 신재생 열에너지 제도권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지난해 5월부터 연구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신재생 열에너지 의무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신재생 열에너지는 총 11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지열·바이오매스처럼 전기가 아닌 난방 등을 위한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다.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은 열이 아닌 전기를 생산·공급한다.
안진회계법인은 총 세 가지 대안을 내놨다. 일정면적 이상의 신규 건축물주를 대상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열 생산·공급자를 대상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 신재생 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대안 선택에 있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안진회계법인도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할 경우 누적금액으로 2030년까지 약 10조원 이상 정부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지원금·사후검증행정비용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대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안진회계법인이 내린 결론이다.
반면 건축업계와 난방업계는 비용부담이 없는 세 번째 대안을 선호한다.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확산이 특정 업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태양열 등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확산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은 지역난방·개별난방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부담을 특정 업계에 지우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공통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법을 조정하거나 의무가 아닌 권장 정책을 활용해 전체적인 사업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규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열에너지라는 특정 부문의 의무규제로 다른 분야가 피해를 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축물에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 개념으로 이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는 건축산업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