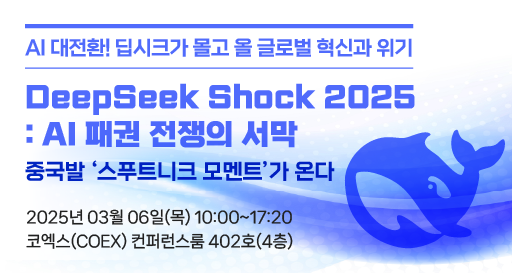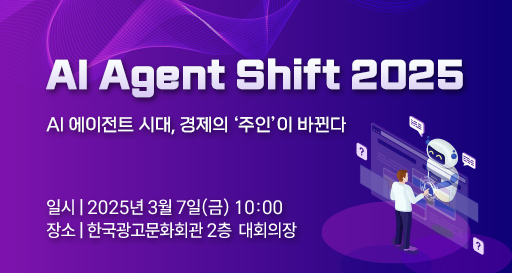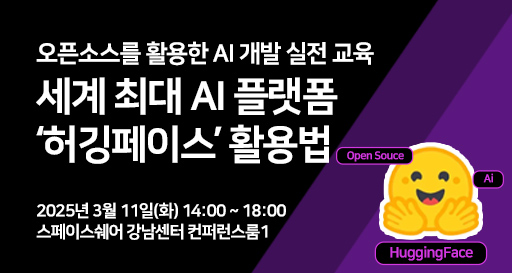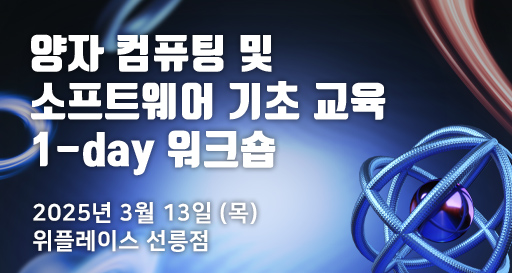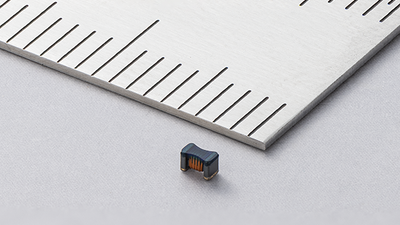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6개 지부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관치금융 철폐와 우리금융 졸속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 가동을 선언했다. 이날 금융위가 `우리금융 매각`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맞대응인 셈이다.
행사는 구호만큼 격렬하지도, 이목을 끌지도 못했다. 진보·노동 관련 매체 외에 별다른 취재 열기도 없었다. 같은 자리에서 지난 27일 있었던 금융노조 기자회견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융위 출입 언론 매체는 총 76개사. 2·3진까지 합하면 족히 200명 가까운 출입기자가 있지만 현장에 얼굴을 비친 매체는 많지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삼세판째 매각 작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외국 투자자도 동등 대우를 해주고, 매각 진행도 국제입찰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유력 매수자로 꼽혀 온 KB국민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인수는 당장 내(임원) 연봉 산출 기준이 되는 주가의 폭락을 뜻하는데 왜 (인수를) 하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우선 소매금융 부문이 겹친다. 우리금융의 현 시가총액은 신한금융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배율(PBR)도 빅4 은행 그룹 가운데 꼴찌라는 사실은 KB를 비롯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에 큰 부담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금융 인수 후보자는 사모펀드(PEF)만 남는다. 김 위원장의 `외국계 동등 기회` 발언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작정하고` 나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론스타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또다시 외국계 자본에 SOS를 보낸다.
오늘은 세계근로자의날(May Day)이다. 밀려오는 외국계 자본의 높은 파고 앞에 한국 금융호는 어디로 `메이데이(mayday·국제무선조난신호)`를 쳐야 하는가.
류경동 경제금융부 차장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