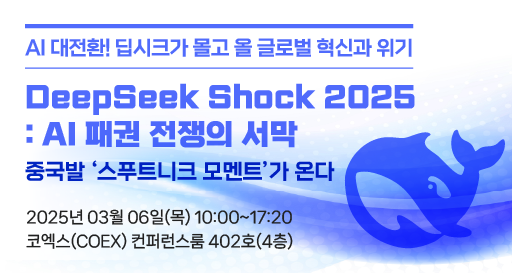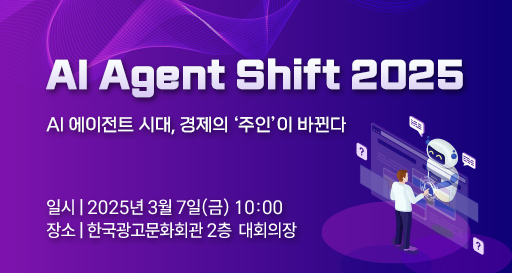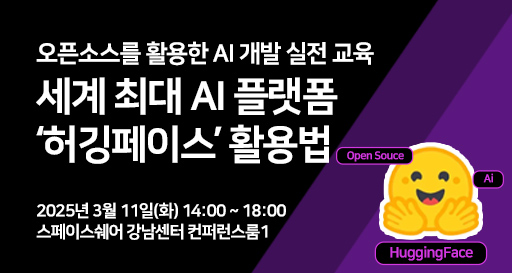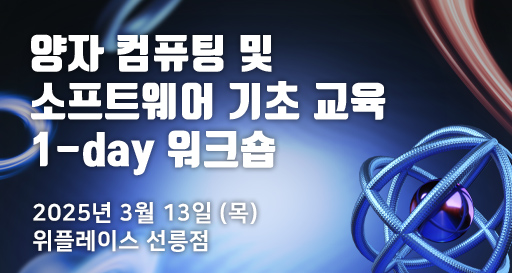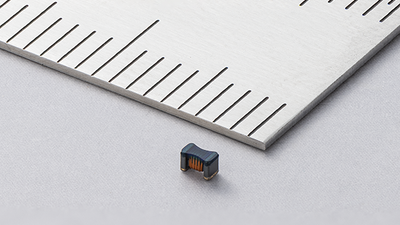킨들로 전자책 시장을 휘어잡은 아마존이 출판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엔 `주문형 출판(on-demand printing)`이다. 미국 출판계는 “출판 시장을 통제하려는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에 밀린 오프라인 산업의 현주소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주문형 출판 서비스를 두고 아마존과 미 출판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정기적으로 출판사에 주문형 출판에 필요한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주문형 출판은 개인 저작물을 소량 출력해주는 서비스다. 아마존은 여기에 더해 정식 출간 서적을 미리 찍어내지 않고 주문받은 만큼만 출력해 배송해줄 계획이다. 재고부담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판매량이 적은 책부터 양도해줄 것을 출판사에 요구하고 있다. 어차피 많이 팔리지도 않는 책을 주문형 출판으로 돌리면 서로 이익 아니냐는 게 아마존 생각이다.
출판업계는 죽을 맛이다. 아마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후폭풍이 두렵다.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하겠지만 결국 주문형 출판이 출판계 흐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렇게되면 지난 수십년간 출판업계가 구축해온 인쇄와 배송, 저장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 출판계 통제권이 출판사에서 아마존으로 완전히 넘어가버리는 것이다. 아마존이 킨들을 앞세워 전자책 콘텐츠 가격을 권당 9.99달러에 파는 통에 들러리로 전락한 출판업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더욱이 주문형 출판 시장에는 전자책 시장에서의 반스앤드노블과 같은 견제세력도 없는 상황이다.
출판 컨설팅업체 이데아 로지컬 설립자인 마이크 샤츠킨 씨는 “출판사에 주문형 출판을 요구하는 것은 출판업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간의 이익이 있겠지만 결국 출판업계 전체가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마존은 출판업계 반응과 무관하게 이미 주문형 출판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2005년 북서지를 인수했고 현재 자회사 크리에이트스페이스를 통해 소형 출판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출판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발 빠르게 주문형 출판으로 갈아탄 출판사도 있다. 미국 기술서적 전문 출판사인 오레일리 미디어는 지난해 주문형 출판업체로 변신하고 160만달러에 달하는 재고비용을 절약했다. 이 업체 로라 볼드윈 대표는 “창고에 먼지 낀 책 대신 주문형 출판에 눈 뜰 때”라고 강조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