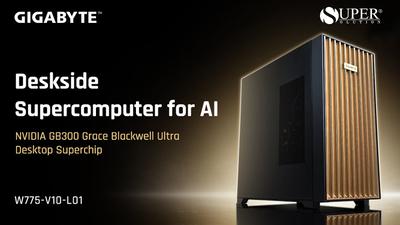최시중 위원장이 27일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부처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중심위원회’로 불릴 정도로 방송 주도 정책으로 비난을 받는 등 균형잡힌 IT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련의 방송정책도 정치적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종편채널도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선정 이후에도 종편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정책적인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급기야 통신정책은 방송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곳곳에서 엇박자를 불러왔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위로 끝났다. 결국 와이브로는 사장될 위기로 몰렸고 경쟁 활성화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료 인하를 위한 히든카드로 꼽혔던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은 사업 개시 1년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이 물러난 결정적 배경이 측근 비리의혹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그나마 내세웠던 명목상 합의와 조정기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미 5인 합의기구 한계는 위원장 사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금의 방통위가 ICT산업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상실한 데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어정쩡한 합의제 기구로 출범시킨 것이 원인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인터넷과 통신정책까지 비전문가 집단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실·국장 권한이 약해졌고, 결국 정책에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 해체론’을 위한 작업이 총론 차원에서 각론으로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조차도 이미 사석에서 방통위 조직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을 정도로 조직 구성과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일부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포스트 방통위’를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방통위 조직을 출범시킨 한나라당에서 조차도 방통위 리모델링을 언급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전제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정보미디어부’와 같은 독임 부처 형태의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과학기술계 등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강력한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임제 부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현정권에서 지정한 초대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무용론을 주장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위원장이 급작스레 사퇴할 정도로 방통위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방통위 해체와 새로운 정부 밑그림을 포함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부처 개편 수순이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