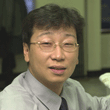
요즘 방송통신위원회는 늘 ‘욕’을 먹는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한 한국의 글로벌 비교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가계통신비가 비싸서’ ‘미디어법 갈등의 빌미를 제공해서’ 등등 이유도 많다. 욕을 먹는 또 하나의 이유가 빠졌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다. 언뜻 보면 그리 보인다. 옛 정보통신부를 계승한 조직인데도 정보통신 정책이 예전처럼 뚜렷하지 않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중앙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새벽에도, 주말에도 나와 열심히 일을 한다.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변명을 이병기 상임위원이 대신해 줬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달 2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1기 방통위 전반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그나마 몇 가지 중요 결정이 이뤄졌으나 올해에는 이렇다 할 게 없었다. 통신사들의 투자나 와이브로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제 ICT 지표에서 하나같이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방통위의 대응 수단이 전혀 없음도 안타까워했다. 그는 “통신 진흥 업무가 미래 발전 그리고 국제경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의 전문성과 경쟁 상황에 부합하는 적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정책 수립·집행과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발언이지만 달리 보면 일을 하려 해도 할 여지가 적은 위원회 조직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위원회 조직인 방통위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기안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른 독임제 부처 공무원들보다 다섯 배는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산술적으로 따져 다섯 배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치고 다시 조율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남들보다 다섯 배 이상 일을 해도 ‘처리해 놨구먼’이라는 말을 듣는 구조다.
언제부터인가 ‘IT정책이 실종됐다’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린다. ‘IT=이제는(I) 틀렸다(T)’는 조크가 세간에 나돌 정도다. 그런데 정작 중심에 서야 할 방통위에 규제만 있고 진흥 기능은 없다. 미래를 담보할 ICT 생태계 조성이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IT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술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큰 그림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을 뿐이다.
방통위원회 위원으로 몸을 담고 지난 1년 6개월간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상임 위원이 어렵게 방통위 진흥 업무의 부재와 비효율성을 공론화했다. 사실 입을 다물고 있을 뿐, 방통위 직원들은 대부분 그 심각성에 공감한다. 산학연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렵사리 공론화한 상임위원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소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오늘 국감을 시작한다. 국회의원들은 방통위가 그간 펼쳐온 정책의 잘잘못을 가릴 것이다. 의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정책이 없다’는 질책을 넘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 바로 정책을 펴고 싶어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