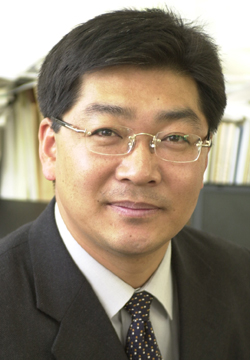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계 과학기술계가 들뜬다. 스웨덴 한림원의 노벨상 수상자 발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 등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교수와 연구원들의 이름이 매년 오르내리곤 한다.
한국인으로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비롯한 옥수수박사로 유명한 김순권 경북대 교수, 미국에서 활동 중인 데니스 최 워싱턴대 교수와 승현준 벨 연구소 박사, 조장희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장, 임지순·김진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김정욱 고등과학원장, 변증남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와 유룡 화학과 교수, 박수문·김기문 포스텍 화학과 교수 등이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노벨상이 ‘터질 때’가 됐다는 인식도 상당하다.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제 과학, 수학올림피아드만 해도 금메달이 쏟아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꼽는다.
우선 영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영재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영재교육 제도가 가장 잘 운용되는 나라로 평가받는 미국은 123년 전인 지난 1886년 이미 영재들에게 속진교육을 시켰다. 1891년에는 영재들을 위한 전담교사를 뒀고 1957년 옛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연방정부와 50개주에서 영재교육관련 법안과 예산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학생의 우수성과 천재성이 드러나면 바로 과학고나 외국어고에 진학해 법대나 의대, 한의대로 빠지는 국내 풍토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노벨상을 배출할 토대가 되는 환경도 중요하다. 과학기술 R&D의 대명사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수학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대전의 한 우동집과 슈퍼마켓이 들어선 주상복합건물 2층을 임대해 쓴다. 일부 기관은 2년째 민영화 논의로 혼란스러워한다. 해양학은 전국대학 중 변변한 해양조사선이 있는 곳이 전무하다. 성과만 강조하는 과학기술 정책보다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은 지난해 4명이 노벨상을 받았고 과학기술분야 수상자 수를 모두 합치면 13명이나 된다. 형편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다. 시스템이나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묵묵히 한 자리에서 10년, 20년을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갖춰져 있을 뿐이다. 툭하면 나무가 잘 자라는지 뽑아서 뿌리를 살펴보는 냄비 근성보다는 차분히 투자하고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나로호 발사가 국민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나로호의 절반의 성공을 두고 예산 증대와 처우개선, 항공우주 개발사업 확대 등을 외치던 목소리도 함께 사그라지고 있다. 단편적인 예지만 의미하는 바는 크다.
지난해 57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KAIST에 기부해 화제를 모았던 한의학자 류근철 박사가 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KAIST생을 대상으로 노벨상을 받는 학생에게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84세인 류 박사는 단 10년 만이라도 가능한 더 투자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과학기술계의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나올 때도 됐다.
대전=박희범 전국취재팀장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