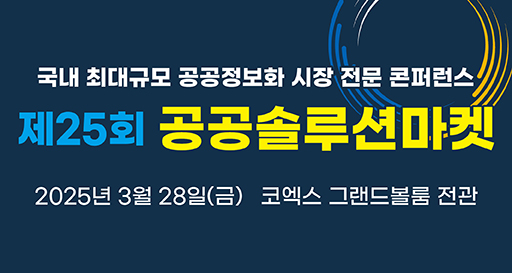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창(window)은 기다림을 모른다고 했다. 흔한 얘기 같지만 한번쯤 되새겨볼 만하다. 시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뒤집어 보면 인간의 유한성, 기회의 제한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구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흐름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유한성이 더욱 자주 거론된다. 물론 시간이란 것은 어느 것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산업계에서 말하는 시장과 사람, 기업에도 유한성이란 것은 똑같이 적용된다.
도스와 같은 운용체계(OS)에서부터 선마이크로시스템스·컴팩·DEC·탠덤 등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굳이 리먼브러더스 등 거대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미 월드컴이 인터넷이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BT·보다폰 등 세계적 통신사업자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고전적 의미의 방송만을 고집하는 방송사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대표적인게 CNN이다. CNN은 거대 지상파방송사에 맞서 100여개의 채널이 가능한 케이블로 뉴스시장을 석권했지만 무한대 채널이 가능한 인터넷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기자와 특파원 시스템만으로는 양방향성을 매개로 한 뉴미디어를 속도에서나 신선도, 수익성 측면에서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
오죽하면 톰슨 BBC 회장이 브로드캐스팅의 시대는 가고 ‘보드캐스팅’의 시대가 왔다고 했겠는가. 이제는 양방향성을 갖춘 실시간 뉴미디어의 전성시대다.
뉴스를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뉴스를 다시 만들어 보내오고 방송신호마저 인터넷으로 운반, 융합콘텐츠를 수도 없이 생산해 내보내게 됐다.
시간의 변수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KBS와 MBC도 예외는 아니다. 기술·산업적으로 다가온 현실을 마냥 공영의 틀 안에서 버텨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의 창이다. 기존 업계가 구축하고 있는 기득권이 지나치게 고집스럽고 방어적이어서 기회를 놓친 채 시간의 창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변화에 대한 소극성은 곧 기득권의 저항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 같은 저항이 민주와 공익이라는 탈을 쓰기도 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미 일정을 정해두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유한성을 담보로 모든 걸 정부와 국민이 부담하라는 식이다. 가전사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와이브로와 IPTV·DMB는 더욱 그렇다. 기술과 소비자의 반응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3년, 5년 자꾸 늦춰지고 변질이 되다 보니 세계 각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디지털의 진화라는 것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의 유한성은 기술과 시장 및 기업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득권이나 정파성을 떠나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의미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초인이든 전도사든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다행히 와이브로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특정산업을 정권브랜드로 치부하는 인사가 대거 포진한 MB정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시간의 창이 열리고 닫히는 지금, 이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전도사들의 등장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박승정 정보미디어부장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