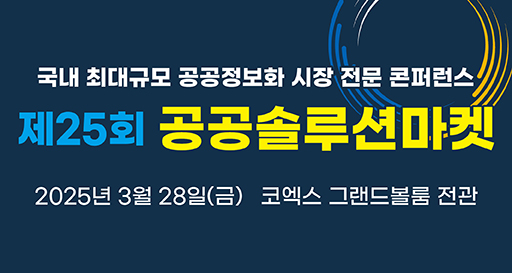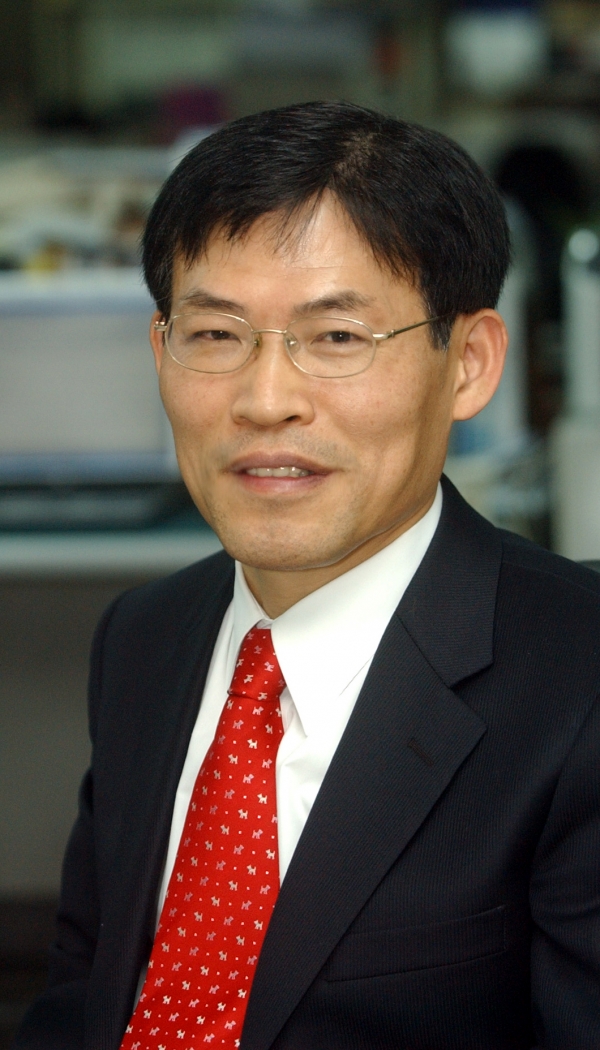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인하 대상과 범위가 저소득층·청소년·노인 등에 맞춰진다고는 하지만 이 말을 곧이 들을 이는 없을 듯하다. 통신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요금 인하 파장이 어떤 계층이나 분야에 제한돼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나서서 ‘요금 합리화’ 운운해 버렸으니 요금 인하는 이미 경제나 산업 논리를 넘어 ‘사회적 합의 로 간주돼버린 상황이다.
참으로 말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느니, 사업자의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었느니, 정통부가 사업자만을 편드느니 등등…. 이런 논쟁들은 결국 청와대의 전면 등장으로 사회적, 정치적 컨센서스를 위한 과정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 시점에서 어느 사업자가 “지금 요금을 인하하면 회사의 기반이 흔들리고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진다”며 하소연한들 콧방귀나 뀌겠는가. 어느 존경받는 학자가 “요금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게 소비자·사업자·정부 모두에 좋은 일”이라는 논리를 세운다 한들 이 사회가 반응하겠는가. 오죽 했으면 눈치 빠르기가 곰삭을 대로 삭은 사업자들이 요금인하 방법을 제안하고 나섰을까. 주무 부처인 정통부가 이제 와서 번복하거나 어쩌고 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는 2000년 이후에만도 네 차례나 단행됐다. 그 차례마다에는 적어도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인하 시기가 모두 총선·지방선거·대선과 같은 선거 때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인하 결정이 사업자 자율이 아닌, 사실상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의 여론몰이에 따라 가입비와 기본료, 무선인터넷이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이 내려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인하 근거나 인하폭에는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요금 정책은 사실 정통부로서도 오랜 딜레마다. 어떤 점에서는 정통부가 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차단하며 일정부분 요금정책을 주도해온 측면이 강하다. 주파수 효율성에 따라 원가보상률에서 유리한 선발사업자(SK텔레콤, 800㎒)와 그렇지 못한 후발사업자(KTF·LG텔레콤, 1.8㎓)를 일정기간 공존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에 요금 수준을 맞추면 KTF·LG텔레콤의 적자가 확대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적용하면 SK텔레콤의 초과이윤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97년 이후 10년간 이동통신 시장 전체 순이익의 80% 이상이 선발사업자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런 결과는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들의 요금인하 주장의 주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요금인하 때마다 논쟁이 재연되고 공통의 법칙이 적용되는 한 당국이 아무리 통신 선진화나 규제완화를 떠들어봐야 소용 없는 일이다. 당장 정통부가 올 초에 마련한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의 권위가 크게 훼손당하게 됐다. 로드맵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하겠다며, 또 자율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사업자들을 어렵게 설득해 만든 새 정책 틀이다. 딜레마와 공통의 법칙을 제도개선으로 돌파하겠다는 정통부 의지가 무색해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조만간 다섯 번째의 요금 인하가 단행된다. 물론 이번에도 세 가지 공통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그 모양새를 어떻게 갖추냐가 관건으로 남았을 뿐이다. 정통부로서는 내키지 않겠지만, 다시 사업자를 불러 모아 ‘요금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대체 이런 악순환 고리가 언제쯤 끝이 날까. 이쯤 해서 차라리 청와대가 직접 통신요금 정책을 챙기는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서현진 정책팀장·부국장대우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