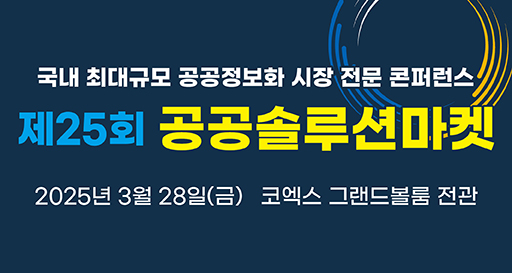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이 열린 지 꼭 1년이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후 대덕특구지원본부가 출범했고 기존의 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3·4 산업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그린벨트 지역 등을 아우르는 총 2130만평 규모의 대덕특구가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특구 최대 현안인 기술사업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소기업 설립 작업이 출연연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조만간 기술사업화협의회도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 프로젝트도 가동되고 있다. 특구 브랜드인 ‘대덕이노폴리스‘가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는 홍콩과 미국에서 해외 로드쇼가 성황리에 열렸다.
대덕특구는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큰틀인 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황우석 박사의 세계 줄기세포 허브 육성, 로버트 러플린의 KAIST 총장 영입과 더불어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 가운데 둘은 실패로 결론났다. 대덕특구가 더욱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15년 이내에 2∼3개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산업공단을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중이다.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노른자위가 바로 대덕특구다. 대덕특구의 성패가 바로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성패와 운명을 같이한다.
대덕특구의 2015년까지 비전은 대덕특구를 ‘선진한국의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참여정부의 꿈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입주기업을 현재의 820여개에서 3000여개로, 그리고 매출액을 3조6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20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특구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특구가 선진한국의 성장엔진으로 성장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연구 부문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인 기술사업화 실적이 기대 이하다. 얼마 전 특구지원본부가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연구소기업 신청을 받았지만 한 곳에 불과했다. 기술사업화가 의외로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연구원의 창업 열기도 IT벤처붐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식었다. 우수인력이 대거 외부로 유출되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의 인력 풀이 과거에 비해 취약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해외 자본유치도 현재로선 난망한 일이다. 외국 벤처캐피털을 초청해 대덕 기업 설명회를 갖고 최근 미국과 홍콩에서 로드쇼도 열었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대덕 내 풍부한 인적·기술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대덕테크노밸리에 건설키로 한 외국인 전용공단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송도·포항 등이 대덕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송도밸리가 인천공항이라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앞세워 해외자본에 추파를 던지고 있으며 포항 등 지역이 특구 지정에 전력투구할 태세다.
대덕에서 자생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적다는 점도 대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2015년까지 20개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는 비전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대덕 내 벤처 기업이 20개에 크게 미달한다. 대덕 내의 토착 기업보다는 외지의 유망 벤처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냐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대덕특구 내 주민과의 마찰도 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특구 내 토지 수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특구의 전체 조감도가 바뀔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덕특구의 갈길이 멀고 험하다는 게 너무도 자명하다.
◆장길수 경제과학부 부장 ksjang@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3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4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5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7〉똑똑한 비서와 에이전틱 AI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6〉산업경계 허무는 빅테크···'AI 신약' 패권 노린다
-
8
[데스크라인] 변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
9
[ET톡] 지역 중소기업
-
10
[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