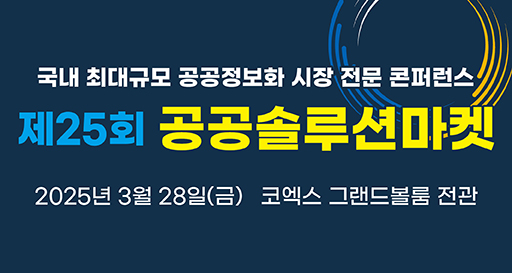결국 이변은 없었다. 중소 무역인들이 낙하산 인사와 관치 회귀라며 회장단에 반기를 들었지만 ‘이희범 대세론’의 경계를 넘지는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이 무역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참여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마터면 큰일 치를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협회 사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정부 각 부처에 개방형 직제를 도입, 효율성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마당에 민간 경제단체에 전직 고위 관료를 내려보내는 것이 합당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여러 경제단체에 고위 관료출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결코 좋은 징후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경제단체에 관료출신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 역시 옹색하다. 한국경제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고위관료의 행정경험과 경륜이 무역진흥에 도움이 된다면 무턱대고 마다 할 일도 아니다. 협회장의 출신성분을 떠나 무역업계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 정부와의 교량 역할과 수출애로 타개에 힘써주면 그뿐이다.
이제 공은 신임 회장에게 넘어갔다. 선출과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임 회장에게 맡겨진 무역진흥의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회장 선임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후유증을 극복하고 무역업체들이 수출전선을 원없이 누빌 수 있도록 믿음직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중소무역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다행스럽게도 이 회장은 장관 재직시절 중소기업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정책을 내놓아 신임을 얻었다. 정책 입안에 많은 공을 들인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시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논리 개발에 진력해 온 이 회장의 행보가 협회에서도 계속 이어지리라 믿는다.
중소 무역인들이 한꺼번에 쏟아낸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FTA 체제 등 새로운 무역질서로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신임 회장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 등 현안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하게 분출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협회의 소임이다. 경우에 따라선 외국 정부나 이익단체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민간 사절단으로서도 기능해야한다.
협회 내부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도 긴요한 문제다.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협회는 7만여 회원사를 거느린 자산 규모 1조2000억원의 경제단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구설과 의혹의 대상이 되곤 했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역풍으로 내부의 결속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수익성 중심의 협회 운영으로 공익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있다. 모두 신임 회장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부분이다.
선출 과정에 일부 잡음이 있긴 했지만 신임 회장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크다. ‘실무형’이란 별칭이 말해주듯 이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현장을 직접 챙기고 확인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무역과 수출정책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무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이런 장점들이 무역협회를 혁신하고 관치회귀라는 외부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길수 경제과학부 부장 ksjang@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3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4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5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7〉똑똑한 비서와 에이전틱 AI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6〉산업경계 허무는 빅테크···'AI 신약' 패권 노린다
-
8
[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
9
[ET톡] 지역 중소기업
-
10
[기고]딥테크 기업의 규제 돌파구,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