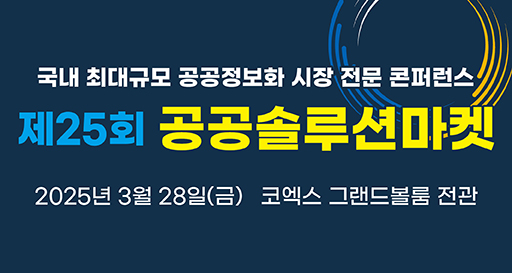기업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굵직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의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돼 있다는 것부터 그렇다. 여전히 들끓는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집단소송제도, 다시 불붙은 법인세인하 논쟁, 주 5일 근무제 공방,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재벌기업의 분식회계파동, 격렬했던 노사문제….
이 와중에서 기업가들은 ‘강력한’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중국으로 떠나겠다고 아우성이고 기업현장에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극심해지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려야 할지 도통 가닥이 안잡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가깝게는 새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시각이 대세를 이룬다.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등 4∼5개 과제가 기업활동의 재검토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확대보급을 들어 권리의식이 높아진 비자본가들의 부상이라는 시각도 어딘가 개운찮은 맛을 남긴다. 성장과 분배간의 괴리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기업경영의 가장 큰 목표는 뭐니뭐니해도 매출규모를 늘려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시는 것이다. 이런 목표의 달성은 규모에서 비롯되는 브랜드 경쟁력, 상품 커버리지, 유통망 장악력 등을 담보로 할 때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규모의 경영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변질되고 있다.
장기불황을 겪으며 부침이 극심해지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단적인 사례다. 마쓰시타·히타치·도시바·일본전기 등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2000년 이후 뒤늦게 시작한 구조조정으로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현금창출원(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기계·브라운관·메모리·오디오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반면 규모의 열세를 실감했던 샤프·산요·파이어니어 등 중견기업들은 개별사업마다 수익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낮으며 수익지향적인 핵심부품사업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응양식은 지속적이고도 능동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와 전체 이익률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모델은 바로 이런 민첩성에 기반을 두는 것들이다. 디지털식 사고는 0과 1로 구성되는 논리가 핵심이다. 이 논리는 경험에 의존하는 감성적 사고나 기계적 정밀성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첩성은 이런 논리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이제 핵심모듈은 디지털논리로 무장한 소수의 두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나머지 과정은 단순반복작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일본기업들은 지금 이런 디지털논리 경쟁에 기업의 생사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사건들은 공세를 취하는 쪽이나 수세에 있는 쪽 모두 디지털사고와는 무관한 것처럼 비쳐진다.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소모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세 쪽이나 방어 쪽 모두 한통속의 시대적 반항아로 치부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20세기 산업사회적 사고와 새로운 디지털논리의 충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식 사고는 앞으로 논리적 민첩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논리가 바야흐로 기업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서현진 디지털경제부장 jsuh@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3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4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5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7〉똑똑한 비서와 에이전틱 AI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6〉산업경계 허무는 빅테크···'AI 신약' 패권 노린다
-
8
[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
9
[ET톡] 지역 중소기업
-
10
[데스크라인] 변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