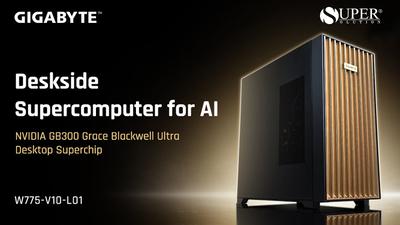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아시아는 미국의 전자쓰레기(e-waste) 처리장.’
PC·휴대폰·TV 등 미국의 폐전자제품들이 중국·인도·파키스탄 등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돼 이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베이즐 액션 네트워크(BAN)’ ‘실리콘밸리 톡식스 콜리션(SVTC)’ 등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발표한 ‘위험수출:아시아로 버려지는 하이테크 쓰레기(Exporting Harm:The High-Tech Trashing of Asi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버려진 전자제품 쓰레기 가운데 50∼80%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돼 해당 국가는 물론 주변국가의 환경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되는 폐전자제품 종류=미국에서만 매년 2억2000만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폐전자제품들이 쓰레기 증가세를 가속시키고 있다. 폐전자제품 가운데 아시아지역에 수출되는 것으로는 PC와 그에 딸린 모니터용 CRT, 각종 케이블, 본체용 플라스틱, 부품 등이다. 또 휴대폰, 프린터 카트리지, TV수상기 등도 상당량이 아시아로 버려지고 있다.
◇위험성=전문가들은 폐전자제품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납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납은 서킷보드와 CRT모니터의 유리패널 등에 사용되며 인체에 누적돼 두뇌손상 등을 불러온다. 또 수은, 카드뮴, 플라스틱 화합물 등도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수출 이유=반면 미국은 폐전자제품 처리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데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에서는 CRT모니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폐전자제품들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특히 경제력이 떨어지는 중국·파키스탄·인도로 쏠리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전자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출이 용이한 것도 전자쓰레기가 아시아로 몰려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노동단가가 저렴해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문제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기유의 경우 마을 전체가 전자쓰레기 처리장화하면서 외지에서 온 10만명의 인원이 폐기 컴퓨터를 분해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기유에서는 일당 1.5달러를 받고 인부들이 밤에 컴퓨터 케이블, 플라스틱, IC 등을 태우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인부들은 맹독성 물질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독성 플라스틱이나 케이블을 태우거나 독성이 강한 서킷보드와 모니터를 분해해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암성 연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질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실제 기유지역에서 채취한 강물의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190배나 넘어서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환경단체들은 인디아와 파키스탄에서도 기유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이 각지로 쓰레기를 수출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자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고속·저가·고품질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등 전자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매년 수백만개의 PC와 휴대폰, TV가 버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고 컴퓨터 처리분야를 새로운 사업으로 표현하는 등 폐전자제품 처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밝혔고 유럽연합(EU)이 오는 2006년까지 폐가전 등의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에 다 쓰고 버리는 폐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앞서가고 있지만 실제 정보기술(IT) 대국인 미국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전자폐기물(e-scrap)법’이 제안된 바 있지만 미국내 전체로 확산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상무부 역시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BAN의 관계자는 “미국이 유럽의 본을 받아야 한다”면서 “개도권에 대한 독성물질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은 정보통신 업체들이 폐기되는 자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장에 기반한 회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현실판 스타워즈?… 中, 10만톤급 '우주 항공모함' 콘셉트 공개
-
2
눈밭에 사람 팔이… 스위스 설산서 구사일생한 남성
-
3
드디어 '화면 속' 들어가나… 아이폰18 프로, 내장형 페이스 ID 적용 전망
-
4
네 개의 다리로 산을 등반하는 '짐승형 로봇' 등장
-
5
승무원 채용 탈락하자 가짜 유니폼 입고 비행기 탑승 성공한 20대 여성
-
6
과학 유튜버, 코카콜라 맛 화학적 재현 성공…특유 뒷맛까지 완벽
-
7
“페이스ID 없다”… 폴더블 아이폰, 터치ID 선택한 이유는?
-
8
속보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협력의제 논의”
-
9
곧 무너질 듯한 '트럭' 몰던 남성… 美 커뮤니티가 나섰다
-
10
실종된 日 여성, 단골 술집 벽 안에서 시신 발견… 범인은 사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