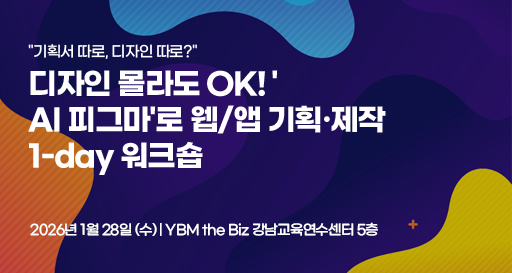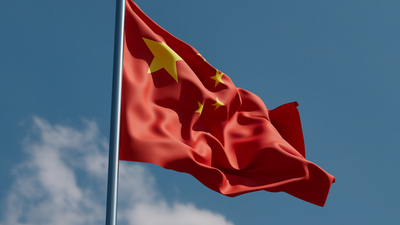발신자번호표시(콜러ID)전화기 생산업체들이 수요위축과 과잉생산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통신이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청사진에서 밝힌 70%의 서비스가능지역이 실제로는 15%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콜러ID전화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말만 믿고 생산을 대폭 늘렸던 콜러ID전화기 생산업체들은 엄청난 양의 재고부담뿐 아니라 심각한 현금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콜러ID서비스 개통기간은 소비자들이 신청후 이틀내 가능할 것이라는 한국통신의 주장과는 달리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다 한정된 서비스지역으로 가입자들이 서비스 이용가능지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조차도 일부 지역에서는 발신자 추적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구전효과(?)를 발휘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다. 한국통신이 앞서 공표한 65∼70%대의 콜러ID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러ID보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코드를 이리저리 뺏다 꽂는 이른바 ‘짬빠’ 작업에 의존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콜러ID전화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다 .
콜러ID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라 한국통신 인증을 받기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한 단말기 사업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과잉투자 논리를 내세워 과부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한국통신 인증을 획득하라고 한 상태에서 한국통신 위탁대리점들이 저가의 중국산 전화기를 수입판매하는 행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글지원 15자, 메모리 장착 및 대형 LCD 장착 등의 한국통신 인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원가 인상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해 놓은 상황에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국내 업체들에 강요했던 한국통신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은 중소 벤처기업들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 청사진이 사업초기부터 빛이 바랜다면 어느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이를 따를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콜러ID서비스 청사진이 당초 계획대로 펼쳐지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나 한국통신 모두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보안칼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사이버 보안, 협력의 시대
-
2
에스에프에이, 신임 대표에 김상경 전무 선임…SFA반도체 수장도 교체
-
3
[전문가기고] 테슬라 FSD 도입과 사고 책임
-
4
[ET단상]AI는 대기업만의 무기가 아니다
-
5
[기고] 과학 기반 협력으로 공기 좋은 이웃이 되자!
-
6
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 안 해…위증고발 국회에 요청”
-
7
[ET톡] 독일의 선택, 한국의 숙제
-
8
[ET시론]속도 패권 시대:중국의 질주, 미국의 반격 그리고 한국의 선택
-
9
[인사]국세청
-
10
[기고] K뷰티, '제2의 물결'…글로벌 기준 다시 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