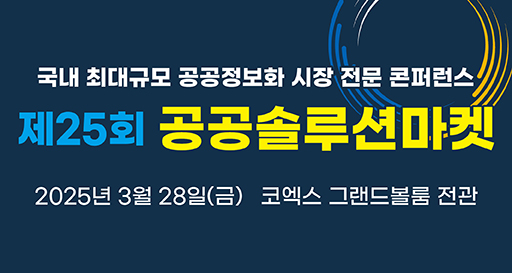국내 기업들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에 설립한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지화 및 토착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에게 현지화·토착화란 이미 보편화된 추세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자국에서 만든 제품판매를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90년대 들어서면서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며 성장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IMF사태를 맞아 전자·정보통신 업계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인식하에 범국가적인 수출총력체제로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대기업들만이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하거나 전략시장에 대한 특성파악에 나서고 있을 뿐 대다수의 기업들에게는 아직 현지화에 대한 개념조차 성숙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난 70∼80년대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및 동남아지역 등 저임금 국가로 진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제조원가 줄이기 및 권역별 블록화로 높아가고 있는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 95년 이후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장이 해외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들어 오히려 급격한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해외사업장들이 폐쇄되거나 국내로 철수된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주도해 왔던 LG전자·삼성전자 등의 가전업체들이 최근 해외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세계화의 기치 아래 앞다퉈 설립했던 해외사업장들이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내는 물론 동남아지역 및 CIS·중남미 등지에 몰아닥친 IMF한파와 함께 이들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장이 모두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찍부터 해외경영을 모토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해온 대우전자의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IMF한파로 해외투자를 중단했을 때도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 세계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현지화 작업을 추진해온 결과 올해 해외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흑자행진을 계속하는 호조를 보였다.
최근 가전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빅딜을 통해 대우전자를 인수키로 한 삼성전자가 대우전자의 해외사업장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처럼 현지화에 박차를 가해온 데 따른 것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세계시장은 넓은 만큼 다양한 문화와 환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도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세탁기의 경우 유럽지역과 같이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펄세이터 세탁기와 다른 드럼세탁기를 주로 사용한다. 유럽지역의 경우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 물을 꼭 끓여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장고의 경우도 지역별로 냉각방식이나 냉동실과 냉장실의 위치 등이 다르고 냉장용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문화나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지역에 국내에서와 같은 제품으로는 아무리 치밀하고 매혹적인 판촉전략을 동원한다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올 들어 국내 기업들이 너도나도 수출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바이어들의 계속되는 가격인하 요구와 국내 업체들간에도 치열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수출물량은 늘렸으면서도 매출면에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따지고 보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확대 전략이 이처럼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물량만 늘리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지업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없이 국내에 앉아서 너무 쉽게 공략하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벌어진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