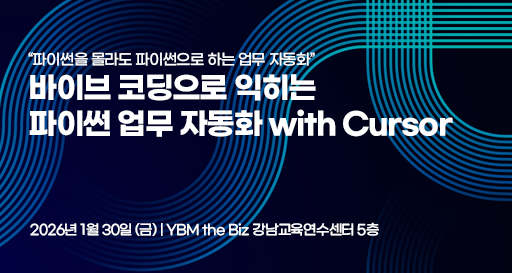과거 수십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우리는 이제 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도 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최근에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현란한 외모에만 집착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들 수 있겠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지형공간정보시스템(GSIS:Geo Spatial Information System)분야에서도 또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면서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GSIS에서 기본도(Base Map)는 식물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 기본도는 대상전체에 대해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만든 3차원(X·Y·Z) 표현도면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지형도를 이용한다. 지형도는 지모·지물(자연물·인공물)의 수평위치(X·Y) 및 수직위치(Z)를 일정한 도식에 의해 표현한 도면이다.
그러므로 기본도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GSIS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뿌리 가꾸기를 소홀히 하고 줄기 가꾸기에만 주력하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결과를초래할 것이다. 부정확한 위치정보에 연계된 특성정보는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GSIS의 현황을 살펴보면, GSIS의 기본이 되는 기본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아 국가정책마저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GSIS에 이용되는기본도의 축척을 전문가의 자문이 거의 없이 비전문가의 주도아래 결정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왕에 결정된 기본도 축척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편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하매설물도는 5백분의 1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백50분의 1, 3백분의 1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천분의 1수치지도를제작한 다음 이를 확대해서 5백분의 1지도로 이용해 지하매설물 관리를 한다고 한다. GSIS에서 이용되는 기본도는 일반적으로 지형도이다. 지형도의 허용오차가 0.5㎜인 점을 감안할 때 허용오차가 1천분의 1에서는 50, 5백분의1에서는 25 된다. 그러나 1천분의 1에서 5백분의 1로 확대할 경우 70~80 오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 작업규칙(안)」에 의하면 「도면제작시 편집의 축척은 최초 입력한 축척보다 확대할 수 없다. 다만정확도가 필요치 않고 국립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허용오차가 30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1998년까지 일부지역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위한 1천분의 1수치지도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사용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무모한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지도축척을 정하려고 계획할 당시국내 지도전문가의 보다 심도 있는 자문과 미래지향적 항측계획을 고려했다면 상황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공학에서는 경제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경제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정확성을 보장 못한다면 신속·정확을 중히 여기는 정보산업의가장 중요한 몫이 상실되는 것이다. 잘못된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있는 풍토가 형성돼야만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이 가속화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지도축척을 1천분의 1과 5백분의 1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니 지도전문가의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가 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GSIS에서 기본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도외시하는 GSIS전문가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상물을 정확히 나타낼수 있는 도면 없이 GSIS에 의한 차원 높은 계획, 설계 및 활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기본도의 제작방법은 종래의 기계법·해석법과 수치적인 방법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본도 작성과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논리로처리하고 있는 데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GSIS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역할분담과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柳福模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장·연세대 교수>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에이전틱 AI 시대의 서막, 에이전트노믹스의 등장
-
2
에스에프에이, 신임 대표에 김상경 전무 선임…SFA반도체 수장도 교체
-
3
[콘텐츠칼럼]한국 영화 위기 '홀드백' 법제화보다 먼저 고려할 것들
-
4
[ET톡] 게임산업 좀먹는 '핵·매크로'
-
5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디지털 자산시장 2025년 회고와 전망
-
6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10〉AI시대의 소통과 대화법 (상)
-
7
[사이언스온고지신]〈끝〉'킴사이버랩'으로 여는 제조 AX의 길
-
8
이윤행 에이딘로보틱스 대표, 산업부 장관 표창
-
9
[부음] 전순달(고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 부인)씨 별세
-
10
[부음] 이상벽(방송인)씨 모친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