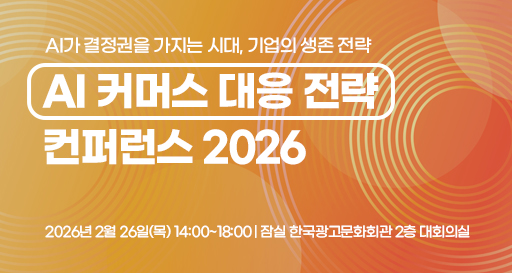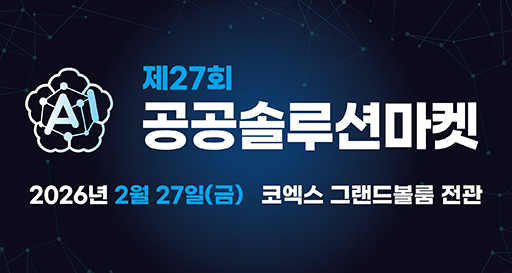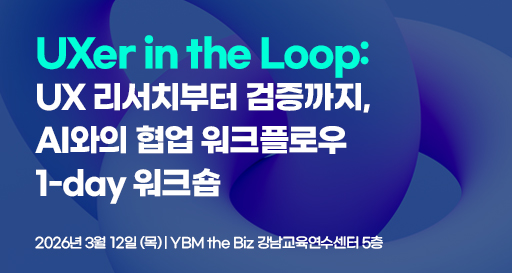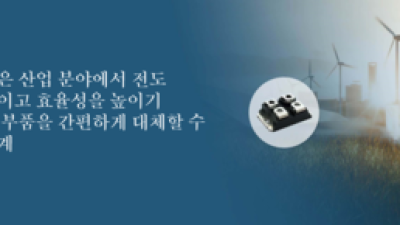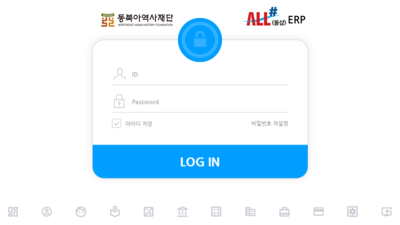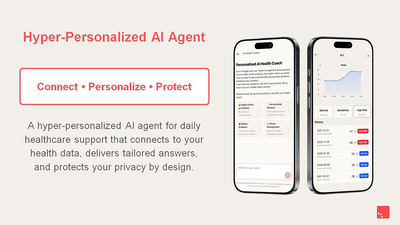단일 가격 중심의 약가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중 적응증 치료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응증별 급여 인정이 까다롭고, 단일 가격만 책정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현행 신약 급여제도가 다중 적응증 치료제 확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면역항암제, 자가면역치료제 등 혁신신약은 기전 특성상 다양한 적응증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급여 적용을 위해선 적응증별로 승인받아야 한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용 속도가 늦다고 의료진은 호소한다.
대표적으로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국내에 비소세포폐암·담도암 등 5개 적응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는 비소세포폐암 1개 적응증만 적용된다. 담도암 치료에 임핀지를 사용하려면 병당 330만이 넘는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홍정용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우리 의료수준이 높음에도 급여 적용이 제한되다 보니 환자 생존율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단일가격 상한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적응증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약제에 단일한 상한금액이 책정되는데, 추가된 적응증의 비교·대체 약제 가격 수준이 다름에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 국가는 다중 적응증 약가 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적응증 가중 평균가 방식을 단일 가격 상한제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적응증이 승인될 때 약가를 재협상하고, 적응증별 환급률과 사용량 등을 고려해 단일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와 유사해 도입 부담을 줄이고, 환자 수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안 교수는 “적응증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은 법령 개정과 적응증 환자 간 형평성 문제로 현행 제도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가중 평균가 방식을 우선 도입한 후 적응증별 청구량 수집·분석해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일 가격 상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환자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자가 신약을 적시에 투여하지 못하는 데에 제도적 원인이 있는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