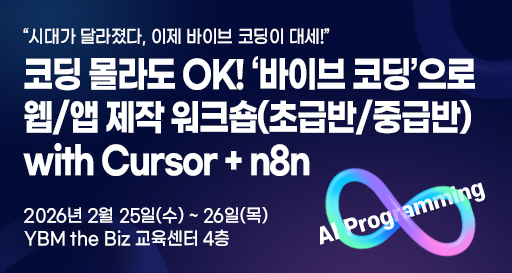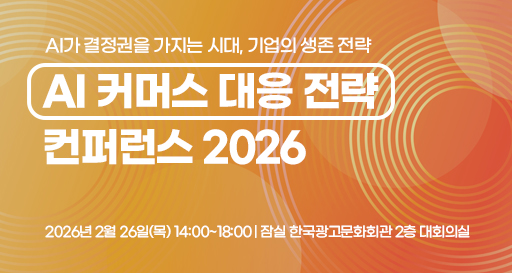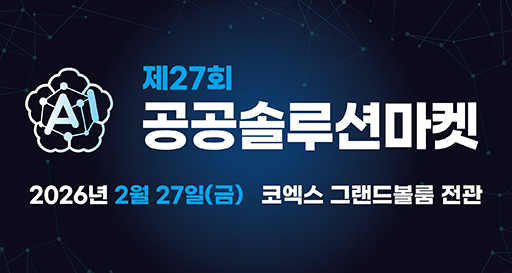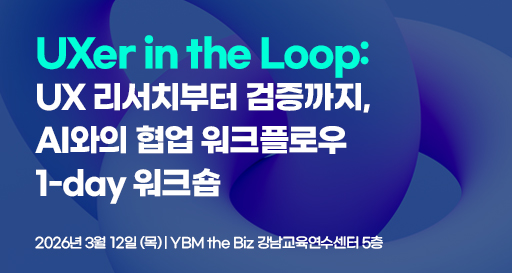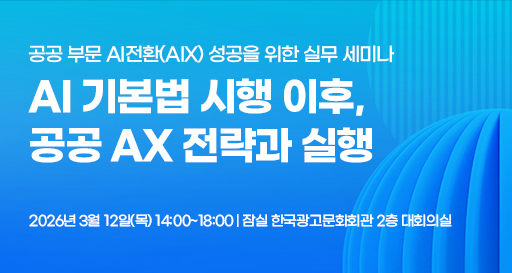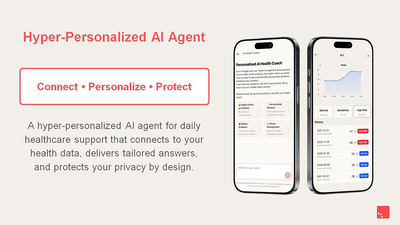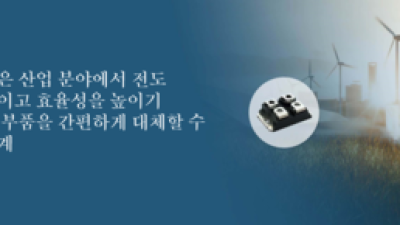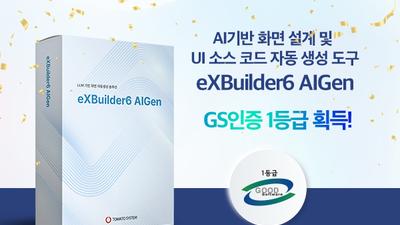하늘 높이 뭉게뭉게 무리를 지은 수증기를 모두 '구름'이라 부른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위치, 형태와 농도가 제각각이다. 권적운, 고적운, 층적운, 적란운 등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불러보자. 바람, 비와의 관계, 폭우, 폭염, 인공강우, 재난대응 등 기술탐구의 시작이 된다. 자연현상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그러나 기술현상에선 '언어 붙이기'가 중요하다. 언어는 기술 탐구와 소통을 쉽게 한다. 생성, 변화, 소멸을 거듭하며 기술, 산업, 시장에 기여한다. 누군가 기술혁신을 이루고 거기에 언어를 붙여 선점해 퍼트린다고 하자. 그들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면 '기술 베끼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기술언어 종속은 기술, 산업, 시장 종속의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다.
산업화시대엔 외국의 선진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들을 추격했다. 외국의 기술언어를 그대로 수용해 그 언어가 가리키는 기술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모방해 산업과 시장을 일으켰다. 머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세부 구성요소, 작동원리를 표현하는 언어가 그것이다. 그런데 세계화, 인터넷은 그 모든 것을 바꿨다. 상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을 타고 국경을 넘어 '실시간' 제공된다. 그들 언어로 배운 기술로 추격에 나서지만 시간부족, 역부족이다. 결국 시장을 뺏긴다. 그들 언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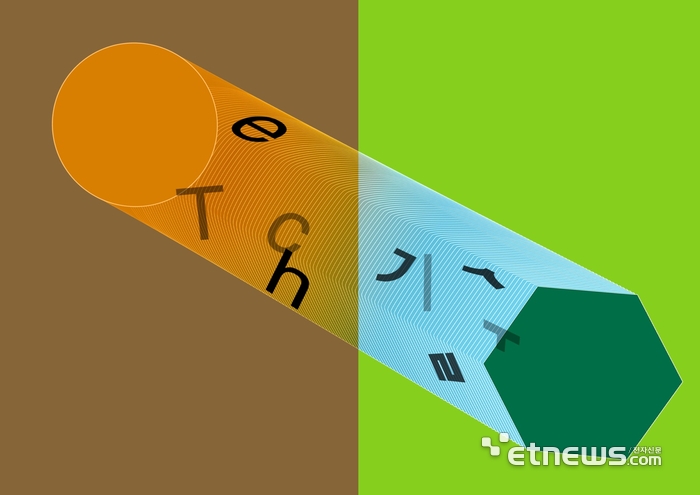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보자. 미국 등 AI강국에서 만들어진 초거대AI, AI에이전트, 피지컬AI 등 생소한 언어가 온라인을 타고 넘어온다. 우리는 감탄하며 그들의 언어를 수용한다. 초거대AI는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추론한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얼마나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져야 그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챗GPT 정도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학습, 추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답은 없다. AI에이전트도 마찬가지다.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적, 법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AI에이전트가 될지 답을 주지 않는다. 피지컬AI는 어떤 모습과 요건을 갖춰야 그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청소로봇 정도로 충분한가. 휴머노이드처럼 인간 같아야 할까. 그들 언어가 우리 기술, 법제, 문화와 맞는지도 봐야 한다. 그들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면 첨단지식에 밝은 지식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 언어에 갇히면 그들 프레임에 예속되고 산업과 시장을 뺏긴다. 그들 언어가 대표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되, 그들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변형해도 되는지, 적합한 다른 언어가 없는지 고민과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외국의 기술언어를 우리 언어로 바꿔 수용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정확히 번역되지 않아 의미가 확대, 축소되거나 다른 의미를 가지면 고유의 기술 현상과 지식을 왜곡한다. 부정확한 언어는 기술호환성을 낮추고 오류를 일으킨다. 우리 환경에 맞게 언어를 택하는 것은 전략이다. 암호화폐를 보자. 처음에 화폐라는 표현 대신 암호자산 등 다른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 화폐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에 기존 화폐의 위상을 공격하게 된다. 암호화폐를 우리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시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새로운 기술현상에 기존 언어를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대입할 때 나타날 위험을 두려워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외국의 기술언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면서 '기술주권'을 외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지만 적합한 언어 선택과 비판적 사용이 효과적인 성장전략이 됨을 잊지 말자.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디지털 생활자' 저자)